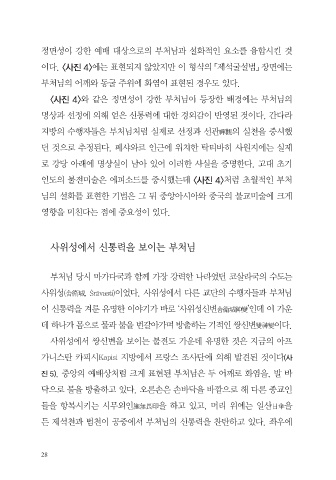Page 30 - 고경 - 2019년 4월호 Vol. 72
P. 30
정면성이 강한 예배 대상으로의 부처님과 설화적인 요소를 융합시킨 것
이다. <사진 4>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 형식의 「제석굴설법」 장면에는
부처님의 어깨와 동굴 주위에 화염이 표현된 경우도 있다.
<사진 4>와 같은 정면성이 강한 부처님이 등장한 배경에는 부처님의
명상과 선정에 의해 얻은 신통력에 대한 경외감이 반영된 것이다. 간다라
지방의 수행자들은 부처님처럼 실제로 선정과 선관禪觀의 실천을 중시했
던 것으로 추정된다. 페샤와르 인근에 위치한 탁티바히 사원지에는 실제
로 강당 아래에 명상실이 남아 있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고대 초기
인도의 불전미술은 에피소드를 중시했는데 <사진 4>처럼 초월적인 부처
님의 설화를 표현한 기법은 그 뒤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불교미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
사위성에서 신통력을 보이는 부처님
부처님 당시 마가다국과 함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코살라국의 수도는
사위성(舍衛城, Śrāvasti)이었다. 사위성에서 다른 교단의 수행자들과 부처님
이 신통력을 겨룬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사위성신변舍衛城神變’인데 이 가운
데 하나가 몸으로 물과 불을 번갈아가며 방출하는 기적인 쌍신변雙神變이다.
사위성에서 쌍신변을 보이는 불전도 가운데 유명한 것은 지금의 아프
가니스탄 카피시Kapisi 지방에서 프랑스 조사단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사
진 5). 중앙의 예배상처럼 크게 표현된 부처님은 두 어깨로 화염을, 발 바
닥으로 물을 방출하고 있다. 오른손은 손바닥을 바깥으로 해 다른 종교인
들을 항복시키는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하고 있고, 머리 위에는 일산日傘을
든 제석천과 범천이 공중에서 부처님의 신통력을 찬탄하고 있다. 좌우에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