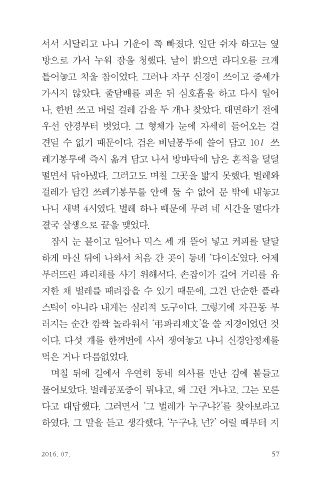Page 59 - 고경 - 2016년 7월호 Vol. 39
P. 59
이 뛰기 시작하며 예의 증상이 시작되었다. 다리가 후들거리 서서 시달리고 나니 기운이 쪽 빠졌다. 일단 쉬자 하고는 옆
는 채, 숨었던 그놈이 다시 나올까봐 장롱 밑에서 눈을 떼지 방으로 가서 누워 잠을 청했다. 날이 밝으면 라디오를 크게
못했다. 겨우 혼을 수습하고 때려잡을 채비를 했다. 행여 발 틀어놓고 치울 참이었다. 그러나 자꾸 신경이 쓰이고 증세가
에 붙기라도 하면 어쩌나, 양말 한 겹 더 신고 그 위에 슬리퍼 가시지 않았다. 줄담배를 피운 뒤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일어
를 신었다. 목장갑을 낀 위에 고무장갑을 끼고 파리채를 찾아 나, 한번 쓰고 버릴 걸레 감을 두 개나 찾았다. 대면하기 전에
손에 들었다. 이렇게 해서 완전무장하고 전투에 임하는 병사 우선 안경부터 벗었다. 그 형체가 눈에 자세히 들어오는 걸
가 되었다.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검은 비닐봉투에 쓸어 담고 10ℓ 쓰
도구들을 챙기러 욕실에 갔다 오는 사이 그놈이 자리를 옮 레기봉투에 즉시 옮겨 담고 나서 방바닥에 남은 흔적을 덜덜
기지나 않았을까 의심하며 장롱 쪽만이 아니라 온방을 두루 떨면서 닦아냈다. 그러고도 며칠 그곳을 밟지 못했다. 벌레와
훑어가며 기다렸다. 그러기를 삼사십 분 쯤, 장롱 밑에서 불 걸레가 담긴 쓰레기봉투를 안에 둘 수 없어 문 밖에 내놓고
쑥 튀어나와 책장 밑으로 쏙 들어 가버렸다. 예상했던 바인데 나니 새벽 4시였다. 벌레 하나 때문에 무려 네 시간을 떨다가
도 워낙 순식간인 데다 너무 놀라서 손을 쓸 수 없었다. 있는 결국 살생으로 끝을 맺었다.
줄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이 증폭된다. 두려움에 잠시 눈 붙이고 일어나 믹스 세 개 뜯어 넣고 커피를 달달
떨며 선 채로 책장 밑을 주시한 지 한참 만에 그놈이 다시 나 하게 마신 뒤에 나와서 처음 간 곳이 동네 ‘다이소’였다. 어제
왔다. 이번엔 방바닥 쪽이어서 들고 있던 파리채로 힘껏 내리 부러뜨린 파리채를 사기 위해서다. 손잡이가 길어 거리를 유
쳤다. 그 순간 파리채 모가지가 딱 하고 부러졌다. 나도 모르 지한 채 벌레를 때려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단순한 플라
게 힘을 너무 준 것이다. 그 소리에 놀라서 주저앉고 말았다. 스틱이 아니라 내게는 심리적 도구이다. 그렇기에 자끈동 부
겨우 시선을 주어 그놈 생사를 확인하니 약간 빗맞았는지 반 러지는 순간 깜짝 놀라워서 ‘弔파리채文’을 쓸 지경이었던 것
쯤 죽어있었다. 그게 더 끔찍하다. 얼른 일어나서 잡히는 대 이다. 다섯 개를 한꺼번에 사서 쟁여놓고 나니 신경안정제를
로 제일 무거운 책을 들고 서류봉투를 그 밑에 대고 위에서 먹은 거나 다름없었다.
조준하여 떨어뜨렸다. 확인사살을 한 셈이다. 그 무거운 책이 며칠 뒤에 길에서 우연히 동네 의사를 만난 김에 붙들고
하필이면 『한국불교전서』 7권이었다. 불조의 힘을 빌려 살생 물어보았다. 벌레공포증이 뭐냐고, 왜 그런 거냐고. 그는 모른
하는 데 썼으니 염라국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다. 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 벌레가 누구냐?’를 찾아보라고
그나저나 이제 이걸 어떻게 치운단 말인가. 한 시간 넘게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누구냐, 넌?’ 어릴 때부터 지
56 고경 2016. 07.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