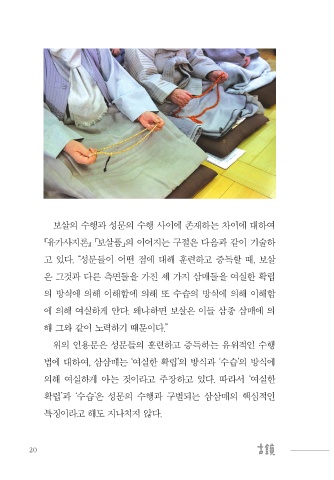Page 22 - 고경 - 2018년 5월호 Vol. 61
P. 22
보살의 수행과 성문의 수행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성문지에서 반복적인 훈
련과 증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가사지론』 「성문품」
에 대한 슈미트하우젠의 설명을 참고하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행자가 생사윤회의 완전한 소멸만이 바라던 목표라는 사
실에 정서적으로 동감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원인은 수
행자가 “나는 고를 고통이라고 본다.” 또는 “나는 열반을 위해
선법을 수습한다.”는 생각에 있다. 이러한 개념화는 수행자가
무의식적으로 이 관찰행위를 자아의 마지막 보루로서 느끼고
보살의 수행과 성문의 수행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하여 있고, 따라서 일체 현존요소의 완전한 소멸인 열반을 이 명상
『유가사지론』 「보살품」의 이어지는 구절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 주체에 대한 부정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것을 정서적으
고 있다. “성문들이 어떤 점에 대해 훈련하고 증득할 때, 보살 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 그것과 다른 측면들을 가진 세 가지 삼매들을 여실한 확립 이러한 아만을 제거하기 위해 성문지에서 채택하는 방법은
의 방식에 의해 이해함에 의해 또 수습의 방식에 의해 이해함 명상적 행위 자체를 관찰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
에 의해 여실하게 안다. 왜냐하면 보살은 이들 삼종 삼매에 의 행자는 명상 과정에서 선행하는 심의 찰나가 뒤따르는 심의
해 그와 같이 노력하기 때문이다.” 찰나에 의해 소멸되며, 즉 그것들도 무상하고 따라서 고통스럽
위의 인용문은 성문들의 훈련하고 증득하는 유위적인 수행 고 무아이며, 그것 뒤에 어떠한 분리된 자아가 확립될 수 없다
법에 대하여, 삼삼매는 ‘여실한 확립’의 방식과 ‘수습’의 방식에 는 사실을 명확히 의식하는 것이다.
의해 여실하게 아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여실한 이러한 관찰방법의 반복 수행은 주관과 객관이 완전히 동
확립’과 ‘수습’은 성문의 수행과 구별되는 삼삼매의 핵심적인 일한 그러한 인식으로 이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무상하고
특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통스러운 이 관찰행위는 동일한 성질을 갖는 바로 직전의 관
20 2018.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