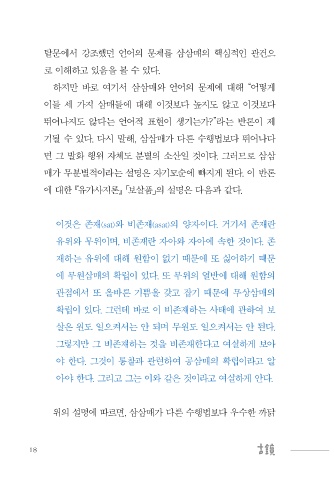Page 20 - 고경 - 2018년 5월호 Vol. 61
P. 20
탈문에서 강조했던 언어의 문제를 삼삼매의 핵심적인 관건으 은 존재와 비존재를 다 포괄하기 때문이다. 유위와 무위는 존
로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재, 즉 실제적인 사태이지만, 자아와 자아에 속한 것은 존재가
하지만 바로 여기서 삼삼매와 언어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아닌 가상, 즉 허구적인 비실재이다. 그런데 유위는 존재이지만
이들 세 가지 삼매들에 대해 이것보다 높지도 않고 이것보다 윤회의 세계를 형성하는 힘이기 때문에 수행으로 추구해서는
뛰어나지도 않다는 언어적 표현이 생기는가?”라는 반론이 제 안 된다. 바로 이 점에서 무원삼매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수행
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삼삼매가 다른 수행법보다 뛰어나다 으로 추구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바로 진실한 존재인 무위의
면 그 발화 행위 자체도 분별의 소산일 것이다. 그러므로 삼삼 열반이다. 그러나 그것은 유위가 아니므로 특정한 표식을 갖지
매가 무분별적이라는 설명은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 반론 않는다. 따라서 열반을 추구하는 수행은 상이 없는 삼매인 무
에 대한 『유가사지론』 「보살품」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상삼매를 확립하는 것이다. 반면, 자아와 자아에 속하는 것은
추구해서도 안 되며 추구하지 않아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이것은 존재 (sat)와 비존재(asat)의 양자이다. 거기서 존재란 것들은 비존재이기 때문에 수행의 진실한 대상이 될 수 없기
유위와 무위이며, 비존재란 자아와 자아에 속한 것이다. 존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존재는 그것이 비존재임을 여실하게 보
재하는 유위에 대해 원함이 없기 때문에 또 싫어하기 때문 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공삼매의 확립이라고 한다.
에 무원삼매의 확립이 있다. 또 무위의 열반에 대해 원함의 그런데 『유가사지론』 「보살품」의 삼삼매에 대한 설명에서 보
관점에서 또 올바른 기쁨을 갖고 잡기 때문에 무상삼매의 이는 “무분별”은 일반적으로 사마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
확립이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비존재하는 사태에 관하여 보 는 용어이다. 따라서 삼삼매는 “모든 관념상의 (재)산출로부터
살은 원도 일으켜서는 안 되며 무원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함축한다. 하지만 슈미트하우
그렇지만 그 비존재하는 것을 비존재한다고 여실하게 보아 젠이 지적하듯이 보살지에서 경험하는 관념으로부터의 벗어
야 한다. 그것이 통찰과 관련하여 공삼매의 확립이라고 알 남, 즉 무분별은 모든 심적 작용이 소멸된 것처럼 보이는 출세
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여실하게 안다. 간지 이전 단계처럼 단순한 잠재적 상태가 아니라 모든 다양성
의 완전한 사라짐을 경험한다는 의미에서 신비적인 초월경험
위의 설명에 따르면, 삼삼매가 다른 수행법보다 우수한 까닭 이라고 할 수 있다.
18 2018.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