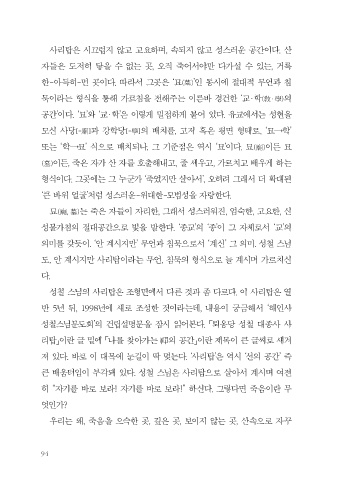Page 96 - 고경 - 2018년 6월호 Vol. 62
P. 96
사리탑은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며, 속되지 않고 성스러운 공간이다. 산 내몰고 있는가? 그런 축출과 배제의 역사는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 삶이
자들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 오직 죽어서야만 다가설 수 있는, 거룩 팍팍해서? 아니 우리들의 삶이 죽음보다 더 위대해서? 우리는 언제부터인
한-아득히-먼 곳이다. 따라서 그곳은 ‘묘(墓)’인 동시에 절대적 무언과 침 가 삶과 죽음을 각박하게 구별하기 시작했다. 다시 그것을 친근한 것과 차
묵이라는 형식을 통해 가르침을 전해주는 이른바 경건한 ‘교·학(敎·學)의 갑고 무서운 것, 아름다운 것과 추악한 것으로 차별하고, 그런 다음 다시
공간’이다. ‘묘’와 ‘교·학’은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다. 유교에서는 성현을 후자를 삶의 세계로부터 축출하기 시작했다. 이 ‘못된’ 인식론적 프레임은
모신 사당[=廟]과 강학당[=學]의 배치를, 고저 혹은 평면 형태로, ‘묘→학’ 어딘가 꼬일 대로 꼬여 있다. 죽음은 삶의 저쪽에 있지 않다. 이쪽, 여기,
또는 ‘학→묘’ 식으로 배치되나, 그 기준점은 역시 ‘묘’이다. 묘(廟)이든 묘 이 속에 있다. 삶의 속살에 동거해 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저쪽이라고
(墓)이든, 죽은 자가 산 자를 호출해내고, 줄 세우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눈길을 돌리며 우겨댄다.
형식이다. 그곳에는 그 누군가 ‘죽었지만 살아서’, 오히려 그래서 더 확대된 무덤은 ‘덤’이다. ‘무(無)의 덤’이다. 맨 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 신발 한
‘큰 바위 얼굴’처럼 성스러운-위대한-모범성을 자랑한다. 켤레 챙겼듯이, 죽어서 흩어지지 않고 여기 살았었다는 ‘표식’과 그런 ‘기
묘(廟, 墓)는 죽은 자들이 자리한, 그래서 성스러워진, 엄숙한, 고요한, 신 억’ 하나를 얻었다. ‘무(無)’에서 ‘덤’으로 얻은 것. 삶의 산자락에, 달빛을 닮
성불가침의 절대공간으로 빛을 발한다. ‘종교’의 ‘종’이 그 자체로서 ‘교’의 은, 꽃 한 송이 피운 것이다. 그만하면 됐지 않은가.
의미를 갖듯이. ‘안 계시지만’ 무언과 침묵으로서 ‘계신’ 그 의미. 성철 스님
도, 안 계시지만 사리탑이라는 무언, 침묵의 형식으로 늘 계시며 가르치신
다.
성철 스님의 사리탑은 조형면에서 다른 것과 좀 다르다. 이 사리탑은 열
반 5년 뒤, 1998년에 새로 조성한 것이라는데, 내용이 궁금해서 ‘해인사
성철스님문도회’의 건립설명문을 잠시 읽어본다. 「퇴옹당 성철 대종사 사
리탑」이란 글 밑에 「나를 찾아가는 禪의 공간」이란 제목이 큰 글씨로 새겨
져 있다. 바로 이 대목에 눈길이 딱 멎는다. ‘사리탑’은 역시 ‘선의 공간’ 즉 최재목
큰 배움터임이 부각돼 있다. 성철 스님은 사리탑으로 살아서 계시며 여전 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영남대 철학과 졸업, 일본 츠쿠바(筑波)대학에서 문학석사·
문학박사 학위 취득. 전공은 양명학·동아시아철학사상·문화비교. 동경대, 하버드대,
히 “자기를 바로 보라! 자기를 바로 보라!” 하신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 북경대, 라이덴대(네덜란드) 객원연구원 및 방문학자. 한국양명학회장·한국일본사상
사학회장 역임했다. 저서로 『노자』, 『동아시아 양명학의 전개』(일본판, 대만판, 중국
엇인가? 판, 한국판), 『동양철학자 유럽을 거닐다』, 『상상의 불교학』 등 30여 권이 있고, 논문
으로 「원효와 왕양명」, 「릴케와 붓다」 등 200여 편이 있다.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6권
우리는 왜, 죽음을 으슥한 곳,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 산속으로 자꾸 의 시집이 있다.
94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