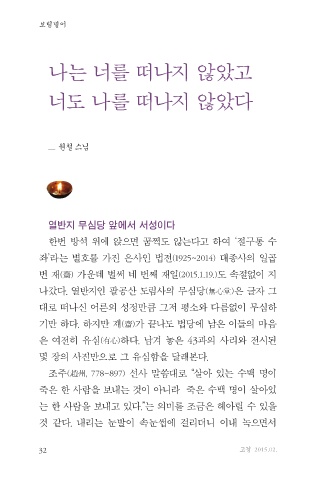Page 34 - 고경 - 2015년 2월호 Vol. 22
P. 34
보림별어
눈물이 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고 늘 땅 구르는 소리와 바람 가르는 소리와 함께 나타나다
너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결국 구순생신 (음 10.8.)은 소진한 모습으로 누우신 채 맞
이해야 했다. 1981년 처음 뵈었을 때, 걸을 때는 두 발에서
땅을 구르는 소리가 났고, 양 팔에서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
가 함께 났다. 1986년 이후 몇 년 동안 어른 곁에서 시봉하
_ 원철 스님
며 살았다. 시자 방으로 건너올 때는 언제나 마루를 쿵쿵거
리며 쏜살같이 등장하시곤 했다. 질세라 문설주에 당신의
손이 닿기 전에 얼른 먼저 문을 열어드렸다. 산책할 때는 어
찌나 빨리 걷는지 뒤따라가기에도 바빴다. 새벽 3시 법당 문
열반지 무심당 앞에서 서성이다 을 열기도 전에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108배를 단숨에 가
한번 방석 위에 앉으면 꿈쩍도 않는다고 하여 ‘절구통 수 뿐하게 마치는 것으로 하루를 여셨다.
좌’라는 별호를 가진 은사인 법전 (1925~2014) 대종사의 일곱 늘 그렇게 재빨랐던 모습으로 남아 있는 스님께서 이번
번 재 (齋) 가운데 벌써 네 번째 재일 (2015.1.19.)도 속절없이 지 겨울에는 하루하루 재(灰)처럼 식어간다. 안타깝게 지켜보
나갔다. 열반지인 팔공산 도림사의 무심당(無心堂)은 글자 그 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 열반(음 11.2.) 후 조계종
대로 떠나신 어른의 성정만큼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하 종단장(曹溪宗 宗團葬)이라는 큰일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났
기만 하다. 하지만 재 (齋)가 끝나도 법당에 남은 이들의 마음 다. 산더미 같은 일거리 앞에 슬퍼할 틈조차 없다. 하지만 입
은 여전히 유심 (有心)하다. 남겨 놓은 43과의 사리와 전시된 관(入棺)할 때는 ‘이제 뵐 수 없는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
몇 장의 사진만으로 그 유심함을 달래본다. 니 저절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조주(趙州, 778~897) 선사 말씀대로 “살아 있는 수백 명이
죽은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수백 명이 살아있 훈수와 실전의 차이를 체감하다
는 한 사람을 보내고 있다.”는 의미를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위패는 추레한 종이 대신 야무지게 나무로 만들었다. 행
것 같다. 내리는 눈발이 속눈썹에 걸리더니 이내 녹으면서 사용 팜플릿은 모두가 소장하고 싶도록 깔끔함을 추구했
32 고경 2015.02.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