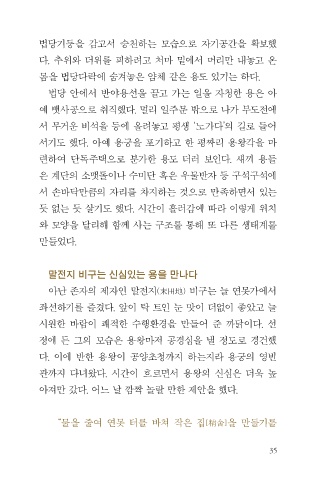Page 37 - 고경 - 2015년 3월호 Vol. 23
P. 37
통도사 자리는 본래 연못임을 구룡지가 증명하다 법당기둥을 감고서 승천하는 모습으로 자기공간을 확보했
깊은 산속의 넓은 평지는 원래 연못자리였을 가능성이 높 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려고 처마 밑에서 머리만 내놓고 온
다. 물을 빼내고 바닥을 고르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가장 몸을 법당다락에 숨겨놓은 얌체 같은 용도 있기는 하다.
손쉬운 방법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하 법당 안에서 반야용선을 끌고 가는 일을 자청한 용은 아
지만 그 호수에 살고 있는 말 못하는 중생들에게 그것은 청 예 뱃사공으로 취직했다. 멀리 일주문 밖으로 나가 부도전에
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저항이 뒤따 서 무거운 비석을 등에 올려놓고 평생 ‘노가다’의 길로 들어
랐을 것이다. 가장 뛰어난 수중동물인 용을 앞장 세워 반대 서기도 했다. 아예 용궁을 포기하고 한 평짜리 용왕각을 마
하는 형식을 취했다. 련하여 단독주택으로 분가한 용도 더러 보인다. 새끼 용들
양산 통도사 창건설화는 그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여 은 계단의 소맷돌이나 수미단 혹은 우물반자 등 구석구석에
준다. 연못을 사찰부지로 만들려는 스님과 이를 반대하는 서 손바닥만큼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있는
용이 팽팽한 대결을 벌인다.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피하기 위 듯 없는 듯 살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렇게 위치
해 신통력으로 연못 물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얼 와 모양을 달리해 함께 사는 구조를 통해 또 다른 생태계를
마 후 “어마! 뜨거워라.” 하고 용들이 도망가기 시작했다. 하 만들었다.
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용이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눈먼
용이라 도망갈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작은 연못을 만들어 말전지 비구는 신심있는 용을 만나다
그 한 마리 용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현재 남아 있 아난 존자의 제자인 말전지 (末田地) 비구는 늘 연못가에서
는 경내의 작은 연못인 구룡지 (九龍池)가 그 전설의 흔적을 좌선하기를 즐겼다. 앞이 탁 트인 눈 맛이 더없이 좋았고 늘
오늘도 말없이 증명하고 있다. 넓은 통도사 경내 역시 계단 시원한 바람이 쾌적한 수행환경을 만들어 준 까닭이다. 선
이 별로 없다는 사실은 이 전설로 뒷받침된다. 정에 든 그의 모습은 용왕마저 공경심을 낼 정도로 경건했
다. 이에 반한 용왕이 공양초청까지 하는지라 용궁의 영빈
여러 가지 이유로 사찰에는 많은 용들이 살고 있다 관까지 다녀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용왕의 신심은 더욱 높
호수를 떠난 용들은 갖가지 재주를 부리면서 여기저기 자 아져만 갔다.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했다.
기자리를 찾아갔다. 어떤 용은 지붕위로 올라갔다. 용마루
끝에 위엄 있는 용두(龍頭)기와로 자리 잡았다. 어떤 용은 “물을 줄여 연못 터를 바쳐 작은 집 [精舍]을 만들기를
34 고경 2015.03.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