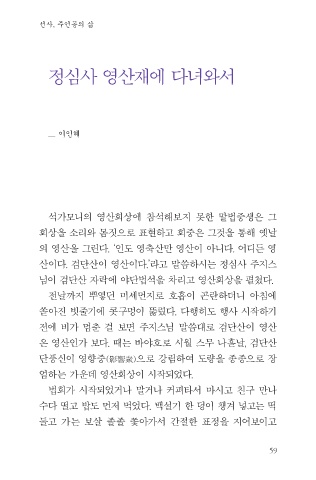Page 61 - 고경 - 2015년 11월호 Vol. 31
P. 61
선사, 주인공의 삶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재치다.
그러나 한편으론 답을 찾기 위해 골몰하는 일 자체가 경
계에 휘둘린 꼴이다. 남에게서 인정받기 위해 마음에 약을 정심사 영산재에 다녀와서
치고 분을 발랐으니, 영락없이 작위 (作爲)다. 이른바 ‘사자새
끼’들이 몽둥이를 들고 씩씩거리는 노인네를 냅다 밀어버린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너 따위가 뭔데 나를 시험에
_ 이인혜
들게 하느냐’는 기백의 몸짓이다.
더구나 답을 찾는다손 잔머리의 결실일 뿐이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둥 인기를 얻어야 한다는 둥 세간의 통념이
부추기는 길에서 원숭이놀음을 벌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심 (無心)이란 남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병
석가모니의 영산회상에 참석해보지 못한 말법중생은 그
을 깨지 않고 병 속에서 새를 꺼내보라고? 병 속에 새가 들
회상을 소리와 몸짓으로 표현하고 회중은 그것을 통해 옛날
어갈 일이 없다.
의 영산을 그린다. ‘인도 영축산만 영산이 아니다. 어디든 영
산이다. 검단산이 영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정심사 주지스
님이 검단산 자락에 야단법석을 차리고 영산회상을 펼쳤다.
전날까지 뿌옇던 미세먼지로 호흡이 곤란하더니 아침에
쏟아진 빗줄기에 콧구멍이 뚫렸다. 다행히도 행사 시작하기
전에 비가 멈춘 걸 보면 주지스님 말씀대로 검단산이 영산
은 영산인가 보다. 때는 바야흐로 시월 스무 나흗날, 검단산
단풍신이 영향중(影響衆)으로 강림하여 도량을 종종으로 장
엄하는 가운데 영산회상이 시작되었다.
법회가 시작되었거나 말거나 커피타서 마시고 친구 만나
장웅연(張熊硯) 집필노동자.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부터 불교계에 수다 떨고 밥도 먼저 먹었다. 백설기 한 덩이 챙겨 넣고는 떡
서 일하고 있다. ‘장영섭’이란 본명으로 『길 위의 절』, 『눈부시지만, 가짜』, 『공부하지 마라』,
『떠나면 그만인데』, 『그냥, 살라』 등의 책을 냈다. 최근작은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들고 가는 보살 졸졸 쫓아가서 간절한 표정을 지어보이고
58 고경 2015. 11.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