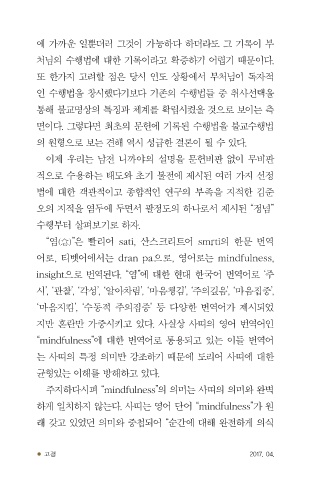Page 16 - 고경 - 2017년 4월호 Vol. 48
P. 16
에 가까운 일뿐더러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기록이 부 하는 것, 동시에 그런 의식을 자각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것”
처님의 수행법에 대한 기록이라고 확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간에 대해 완전하게 의식하는 명상의 상태”로서 재
또 한가지 고려할 점은 당시 인도 상황에서 부처님이 독자적 해석되었다. 이러한 번역상의 불일치가 도리어 지난 20년간
인 수행법을 창시했다기보다 기존의 수행법들 중 취사선택을 인지심리학, 신경과학, 임상심리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불교
통해 불교명상의 특징과 체계를 확립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측 명상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활발하게 시도하게 된 원인을 제
면이다. 그렇다면 최초의 문헌에 기록된 수행법을 불교수행법 공했다.
의 원형으로 보는 견해 역시 성급한 결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원적으로 볼 때 빨리어 sati의 원래 의미는 ‘기억’
이제 우리는 남전 니까야의 설명을 문헌비판 없이 무비판 이다. 한역어 “염”은 ‘기억’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보존하고 있
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와 초기 불전에 제시된 여러 가지 선정 기 때문에 현대 영어 번역어와 비교하면 상당한 괴리를 느끼
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의 부족을 지적한 김준 게 한다. 다른 한역어 “억념 (憶念)”, “수의(守意)”를 보더라도 ‘기
오의 지적을 염두에 두면서 팔정도의 하나로서 제시된 “정념” 억’이란 의미는 사띠가 갖고 있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임을 알
수행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수 있다. 그런데 불교문헌에 사용된 이후로, 사띠의 의미에는
“염 (念)”은 빨리어 sati, 산스크리트어 smŗti의 한문 번역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를 바라보는 입장은 학자
어로, 티벳어에서는 dran pa으로, 영어로는 mindfulness, 들마다 다르다.
insight으로 번역된다. “염”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어로 ‘주 한 부류의 학자들은 사띠 용어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주
시’, ‘관찰’, ‘각성’, ‘알아차림’, ‘마음챙김’, ‘주의깊음’, ‘마음집중’, 의 집중’의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억’
‘마음지킴’, ‘수동적 주의집중’ 등 다양한 번역어가 제시되었 이라는 의미는 불교문헌 속에 사용된 사띠 개념에 적용되면
지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사실상 사띠의 영어 번역어인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이러한 의미 분화
“mindfulness”에 대한 번역어로 통용되고 있는 이들 번역어 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두 주장 사이에 건너기 어려운 간극
는 사띠의 특정 의미만 강조하기 때문에 도리어 사띠에 대한 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Rupert Gethin이 제안한 해결은 매우
균형있는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 흥미롭고 독창적이다. 그는 사띠의 ‘기억’을 심리학에서 말하
주지하다시피 “mindfulness”의 의미는 사띠의 의미와 완벽 는 ‘작업 기억 (working memory)’으로 보기를 제안한다. 즉 우
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사띠는 영어 단어 “mindfulness”가 원 리가 어떤 일을 하는 동안 순서와 과정을 기억해야 하는 것처
래 갖고 있었던 의미와 중첩되어 “순간에 대해 완전하게 의식 럼, 사띠는 기억된 내용보다 기억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 고경 2017. 04.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