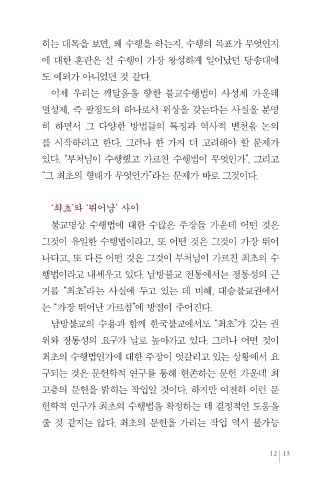Page 15 - 고경 - 2017년 4월호 Vol. 48
P. 15
적 수련방법으로 채택하는 종교들이 있다. 그 방법들 역시 행 히는 대목을 보면, 왜 수행을 하는지, 수행의 목표가 무엇인지
복에 기여하는 방법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 에 대한 혼란은 선 수행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던 당송대에
므로 불교 수행의 목표를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시할 필 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다.
요가 있다. 이를테면 도교 수행의 목표는 양생 (養生), 즉 불로 이제 우리는 깨달음을 향한 불교수행법이 사성제 가운데
장생 (不老長生)이며 그것이 도교 수행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의 멸성제, 즉 팔정도의 하나로서 위상을 갖는다는 사실을 분명
미인 것과 같이, 불교에서도 그 수행의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 히 하면서 그 다양한 방법들의 특징과 역사적 변천을 논의
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문제가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달음”이라는 매우 추상적이 있다. “부처님이 수행했고 가르친 수행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고 난해한 개념을 떠올린다. 명상의 생리적, 심리적 효과를 강 “그 최초의 형태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조하는 오늘날의 풍토에서도 그런 개념이 가장 먼저 떠오르
는 것은 불교 수행의 최종적인 목표가 깨달음이라는 점에 대 ‘최초’와 ‘뛰어남’ 사이
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불교명상 수행법에 대한 수많은 주장들 가운데 어떤 것은
하고 명상을 좀 더 쉽고 친절한 것으로 만들려는 요즘의 경 그것이 유일한 수행법이라고, 또 어떤 것은 그것이 가장 뛰어
향과 반대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일 나다고, 또 다른 어떤 것은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최초의 수
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불교에서 말 행법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남방불교 전통에서는 정통성의 근
하는 행복이 학습능력의 향상이나 창의성 개발에 의해 얻어 거를 “최초”라는 사실에 두고 있는 데 비해, 대승불교권에서
지는 행복도 아니고, 심리적인 병증의 완화를 통해 얻게 되는 는 “가장 뛰어난 가르침”에 방점이 주어진다.
고통의 해소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 남방불교의 수용과 함께 한국불교에서도 “최초”가 갖는 권
선, 다른 명상법들과 불교명상의 차이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위와 정통성의 요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이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교명상에 대한 오해 또는 최초의 수행법인가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요
오용 때문이다. 구되는 것은 문헌학적 연구를 통해 현존하는 문헌 가운데 최
이러한 오해는 오늘날 새삼스럽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고층의 문헌을 밝히는 작업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문
『위산대원선사경책 (潙山大圓禪師警策)』에서 위산영우(潙山靈祐) 헌학적 연구가 최초의 수행법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선사가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는다(以悟爲則)”고 분명하게 밝 줄 것 같지는 않다. 최초의 문헌을 가리는 작업 역시 불가능
● 고경 2017. 0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