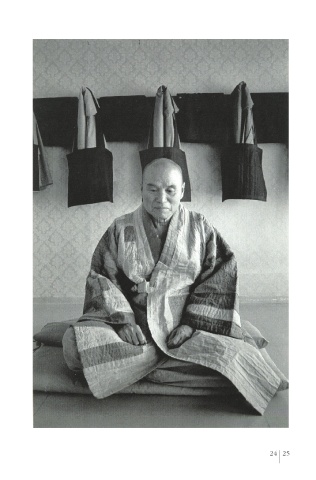Page 27 - 고경 - 2017년 4월호 Vol. 48
P. 27
를 비롯한 제자서(諸子書), 나아가 시(詩)와 부(賦)에도 뛰어났
다. 모두가 일대사인연 (一大事因緣)으로 회통되며, 돈오무심(頓
悟無心)을 종(宗)으로 삼아 견성성불(見性成佛)을 드날리니 달
마 스님의 바로 가리키는 선 [直指之禪]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
다. 가히 강남(江南)의 고불(古佛)이라 칭송되었을 만하다.
여기에 번역된 『산방야화』는 『천목중봉화상광록』 제11권에
해당한다. 저본으로는 『빈가장경 (頻伽藏經)』을 사용했고, 청나
라 광서 (光緖) 신사(辛巳, 1881)년에 고소각경처(姑蘇刻經處)에
서 간행된 판본을 참고로 하였다.
『산방야화』는 대부분 대화체로 이루어졌으며, 참선하는 납
자들이 실제 수행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돈오돈수(頓悟頓修)의
입장에서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에서부터 사
찰의 살림살이에 이르기까지 불자(佛子)들이라면 의심해 볼
만한 것들을 밀도 있고 설득력 있게 풀어 놓았다. 특히 생사
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인이 몸소 깨달아야 한다는 점을 간절하게 일러주고 있다.
이 책은 크게 상・중・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수
행에 관한 납자들의 다양한 물음과 중봉 스님의 자상한 대
답으로 꾸며졌다. ‘교외별전 (敎外別傳)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언어나 문자로도 견성을 할 수 있습니까?’, ‘공안(公案)의 뜻과
그 기능은 무엇입니까?’, ‘수행을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선사들도 계율을 지켜야 합니까?’와 같은 수행 관련 문답은
물론 ‘주지의 소임은 무엇입니까?’, ‘명예욕의 본질은 무엇입
니까?’, ‘사찰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와 같은 사찰
● 고경 2017. 04.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