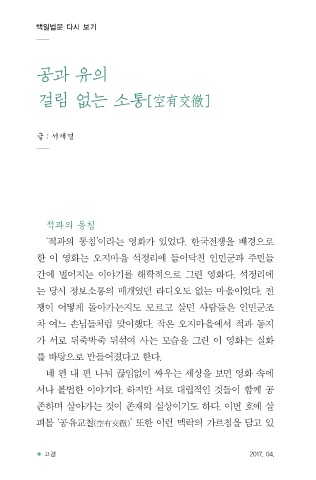Page 32 - 고경 - 2017년 4월호 Vol. 48
P. 32
백일법문 다시 보기
다. 공(空)과 유(有)는 상호 배척되는 것으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다. 텅 빈 공이 있으면 유로 표현되는 존재가 사라
공과 유의 지고, 반대로 유로 표현되는 존재가 있으면 텅 비었다는 공은
있을 수 없다.
걸림 없는 소통[空有交徹]
그러나 존재의 실상을 보면 석정리 사람들처럼 적과 내가
뒤섞여 있다. 따사로운 봄볕에 피어난 한 송이 꽃은 현상적으
글 : 서재영
로 보면 ‘꽃이라는 개체 [有]’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
지만 그 꽃은 햇살, 봄비, 대지의 자양분 등 무수한 존재들과
의 관계 속에서만 피어날 수 있다. 꽃이라는 개체는 오로지 관
계 속에서만 있음으로 눈앞에 있는 꽃이라는 개체는 공하다.
현수법장이 말하는 ‘공유교철’ 역시 ‘공과 유가 서로 걸림
적과의 동침 없이 소통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공과 유는 서로를 배제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개념이지만 실상은 서로 소통하고 뒤죽박죽 뒤섞여 있
한 이 영화는 오지마을 석정리에 들이닥친 인민군과 주민들 다는 것이다. 『백일법문』은 다음과 같은 법장의 가르침을 인
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그린 영화다. 석정리에 용하여 공유교철을 설명한다.
는 당시 정보소통의 매개였던 라디오도 없는 마을이었다. 전
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은 인민군조 “공으로써 유를 온전히 빼앗으니, 공은 있고 유는 없어
차 여느 손님들처럼 맞이했다. 작은 오지마을에서 적과 동지 져 있다는 견해 [有見]가 없어진다. 유로써 공을 온전히 빼
가 서로 뒤죽박죽 뒤섞여 사는 모습을 그린 이 영화는 실화 앗으니 유는 공하고, 공은 없어져 공에 대한 집착이 모두
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없어진다. 공과 유가 상즉상입하여 전체가 서로 통하여
네 편 내 편 나눠 끊임없이 싸우는 세상을 보면 영화 속에 한 가지 모습으로 둘이 없으니, 두 견해를 함께 떠난다.
서나 볼법한 이야기다. 하지만 서로 대립적인 것들이 함께 공 상즉하여 서로 통하여 걸림이 없으면서 무너지지 않아
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존재의 실상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 살 두 상이 서로 존재하니 그릇된 견해 [非見]가 모두 사라진
펴볼 ‘공유교철 (空有交徹)’ 또한 이런 맥락의 가르침을 담고 있 다.”
● 고경 2017. 04.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