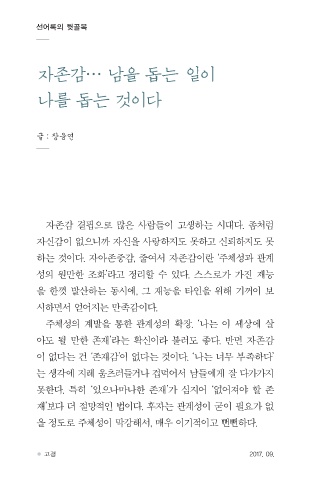Page 52 - 고경 - 2017년 9월호 Vol. 53
P. 52
선어록의 뒷골목
너무 순수하고 착해도 탈이다. 태생이 더럽고 치사한 사바
세계에 좀처럼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울증 환자들은
자존감… 남을 돕는 일이 십중팔구 자의식이 강한 성격이다. 좋은 쪽으로 발현되면 엄
나를 돕는 것이다 청난 생산성과 창의성으로 나타나지만, 나쁜 쪽으로 발현되
면 대인관계의 불화와 자기부정에 빠진다. ‘이렇게 훌륭한 나
를 왜 인정해주지 않나’ 하는 억울함과 ‘왜 저러고들 사나’ 하
글 : 장웅연
는 멸시감이 축적되면서 점점 세상과 멀어진다. 문제는 이런
‘나’는 혼자이고 저런 ‘남’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압도적인
쪽수 차이로 인해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증오의 불길
은 오로지 나만 불태운다.
곧 이승이 냉혹할수록 내가 자비로워야만 한다. 가끔은 나
자존감 결핍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시대다. 좀처럼 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나의 숨통이 트이고, 남을 위해 기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 할 줄도 알아야 내가 행복해진다.
하는 것이다. 자아존중감, 줄여서 자존감이란 ‘주체성과 관계
성의 원만한 조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스스로가 가진 재능 “관대한 태도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위한 덕
을 한껏 발산하는 동시에, 그 재능을 타인을 위해 기꺼이 보 목이다. 재주가 많으면 더 고생하는 법이다. 일을 잘 하는
시하면서 얻어지는 만족감이다.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이치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주체성의 계발을 통한 관계성의 확장. ‘나는 이 세상에 살 더 많이 베푼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야 속 편하다.”
아도 될 만한 존재’라는 확신이라 불러도 좋다. 반면 자존감
이 없다는 건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지닌 어느 비구니 스님은 이렇게
는 생각에 지레 움츠러들거나 겁먹어서 남들에게 잘 다가가지 독자들을,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나를 토닥였다. 남을 돕는
못한다. 특히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심지어 ‘없어져야 할 존 일이 나를 돕는 것임을 알 때 진정한 자존감이 샘솟는 법이
재’보다 더 절망적인 법이다. 후자는 관계성이 굳이 필요가 없 다. 그래야, 또는 그나마.
을 정도로 주체성이 막강해서, 매우 이기적이고 뻔뻔하다.
● 고경 2017. 09. 50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