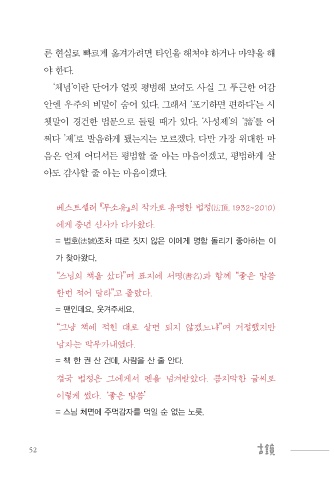Page 54 - 고경 - 2018년 4월호 Vol. 60
P. 54
른 현실로 빠르게 옮겨가려면 타인을 해쳐야 하거나 마약을 해 “마음 비우고 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마음 비워지지 않는다.
야 한다. “걸림 없이 살 줄 알라”는 말을 들었다고 신호등이 없어지는 건
‘체념’이란 단어가 얼핏 평범해 보여도 사실 그 푸근한 어감 아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을 들었다고 남들이 착해지지는 않
안엔 우주의 비밀이 숨어 있다. 그래서 ‘포기하면 편하다’는 시 는다.
쳇말이 경건한 법문으로 들릴 때가 있다. ‘사성제’의 ‘諦’를 어 이렇게 언어는 무능하다. 책 속의 삶은, 책일 뿐이다. 책에서
쩌다 ’제‘로 발음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가장 위대한 마 가르친 대로 살다가 잘못되어도, 책은 책임져주지 않는다. 물
음은 언제 어디서든 평범할 줄 아는 마음이겠고, 평범하게 살 론 덕담을 들으면 위안이 되고 힘이 생긴다. 그러나 귀는 밥을
아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겠다. 먹지 못한다.
말들의 모략과 행패에 가슴 앓으며 오늘도 살아간다. 그래
베스트셀러 『무소유』의 작가로 유명한 법정 (法頂, 1932~2010) 서 ‘좋은 말씀’을 들으러 산으로 올라간다. 사실 다리가 더 튼
에게 중년 신사가 다가왔다. 튼해져 있다. 넘어져야만 일어설 수 있고 할퀴어져야만 아무는
= 법호(法號)조차 따로 짓지 않은 이에게 명함 돌리기 좋아하는 이 것이다. ‘좋은 말씀’이 되어서 산을 내려온다.
가 찾아왔다. ●
“스님의 책을 샀다”며 표지에 서명(書名)과 함께 “좋은 말씀 눈 뜨면,
한번 적어 달라”고 졸랐다. 개벽.
= 팬인데요, 웃겨주세요.
“그냥 책에 적힌 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며 거절했지만
남자는 막무가내였다.
= 책 한 권 산 건데, 사람을 산 줄 안다.
장웅연
결국 법정은 그에게서 펜을 넘겨받았다. 큼지막한 글씨로 — 집필노동자. 1975년생.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부터 <불교신문>에
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본명은 ‘장영섭’. 글 써서 먹고 산다. 포교도 한다. 그간 『불교에 관한 사
이렇게 썼다. ‘좋은 말씀’ 소하지만 결정적인 물음49(2017년 상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길 위의 절(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 등 9권의 책을
= 스님 체면에 주먹감자를 먹일 순 없는 노릇. 냈다. 최근작으로 『불교는 왜 그래?』가 있다.
52 2018. 04.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