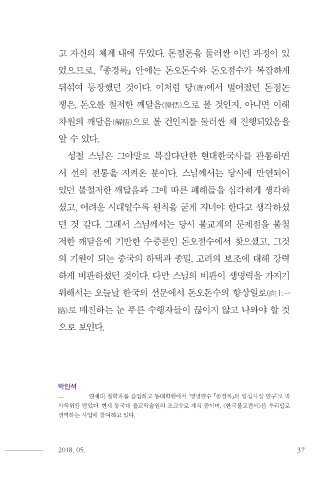Page 39 - 고경 - 2018년 5월호 Vol. 61
P. 39
주지하다시피 마조 스님은 육조혜능-남악회양으로 이어지 고 자신의 체계 내에 두었다. 돈점론을 둘러싼 이런 과정이 있
는 남종선의 선풍을 이어받아 ‘작용이 그대로 본성의 체현’이 었으므로, 『종경록』 안에는 돈오돈수와 돈오점수가 복잡하게
라는 작용시성 (作用是性)의 가르침을 세운 분이다. 평상심시도 뒤섞여 등장했던 것이다. 이처럼 당(唐)에서 벌어졌던 돈점논
(平常心是道)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 스님은 도란 다른 것이 쟁은, 돈오를 철저한 깨달음(證悟)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해
아니라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환히 드러나 있는 것임을 강 차원의 깨달음(解悟)으로 볼 건인지를 둘러싼 채 진행되었음을
조하셨다. 이러한 마조 스님의 관점을 ‘돈오돈수’라고 얘기해보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스님의 후예 가운데서는 수행이 부족하고 통찰이 성철 스님은 그야말로 복잡다단한 현대한국사를 관통하면
미흡한데도, 마조 스님의 말씀을 흉내 내는 이들이 있었던 것 서 선의 전통을 지켜온 분이다. 스님께서는 당시에 만연되어
같다. 그들은 오염되고 결핍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데 있던 불철저한 깨달음과 그에 따른 폐해들을 심각하게 생각하
마조 스님의 ‘평상심시도’와 같은 언구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 셨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원칙을 굳게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셨
인다. 이를 지켜보던 종밀 스님은 마조 스님의 후예들이 부족 던 것 같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당시 불교계의 문제점을 불철
한 이유를 ‘불철저한 깨달음’과 ‘수행의 부족’에서 찾았고, 비록 저한 깨달음에 기반한 수증론인 돈오점수에서 찾으셨고, 그것
돈오하더라도 점수의 과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이 의 기원이 되는 중국의 하택과 종밀, 고려의 보조에 대해 강력
것이 바로 종밀의 ‘돈오점수론’이다. 하게 비판하셨던 것이다. 다만 스님의 비판이 생명력을 가지기
연수(904-975) 선사는 종밀 이후 대략 100여 년 뒤에 활동했 위해서는 오늘날 한국의 선문에서 돈오돈수의 향상일로(向上一
던 인물로서, 마조뿐 아니라 종밀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 路)로 매진하는 눈 푸른 수행자들이 끊이지 않고 나와야 할 것
었다. 연수 선사는 종밀을 배척하기보다는 자신의 돈점론 가운 으로 보인다.
데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주어 포괄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즉 연수 선사는 마조 스님의 ‘평상심시도’를 철저한 깨달음의
경지인 돈오돈수의 모습으로 복원시켰고, 이것이야말로 마조
박인석
의 본의라고 보았다. 다만 수행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돈오점수 —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영명연수 『종경록』의 일심사상 연구’로 박
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불교전서>를 우리말로
의 구도 역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이를 폐기하지 않 번역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36 2018. 05.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