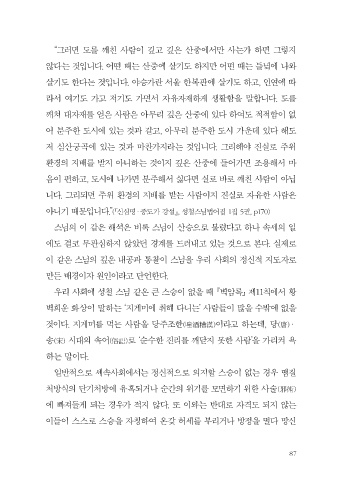Page 89 - 고경 - 2018년 6월호 Vol. 62
P. 89
씀’만이라도 간절히 바랐던 국민의 열망에도 스님은 왜 그리 입을 굳게 다 “그러면 도를 깨친 사람이 깊고 깊은 산중에서만 사는가 하면 그렇지
물고 있었을까? 그 깊은 속뜻을 우리는 세월이 지나서야 어렴풋이 알게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산중에 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들녘에 나와
됐다고 생각한다. 훗날 세월이 흘러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이후 스님이 입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야승가란 서울 한복판에 살기도 하고, 인연에 따
적하신 뒤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침묵이 거대한 메시지이자 큰 가르침이 라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자유자재하게 생활함을 말합니다. 도를
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시비 (是非)는 시비를 부른다. 입을 여는 순간 깨쳐 대자재를 얻은 사람은 아무리 깊은 산중에 있다 하여도 적적함이 없
그르친다는 뜻의 개구즉착(開口卽錯)은 이때도 비켜갈 수 없었을 것이다. 어 분주한 도시에 있는 것과 같고, 아무리 분주한 도시 가운데 있다 해도
불보살의 입장에서 보면 못된 권력자도 가슴에 품어야 할 가련한 중생일 저 심산궁곡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진실로 주위
뿐이다. 세속에서는 못된 놈에게 왜 벌주지 못하느냐고 원망할 수 있으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 깊은 산중에 들어가면 조용해서 마
그 어떤 누구도 인과의 사슬을 벗어날 수는 없다. 큰스님은 일찍이 자신의 음이 편하고, 도시에 나가면 분주해서 싫다면 실로 바로 깨친 사람이 아닙
출가에 큰 영향을 끼친 『증도가(證道歌)』를 통해 이 같은 이치를 꿰뚫고 있 니다. 그리되면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 진실로 자유한 사람은
었으리라. 스님은 “단박에 깨쳐 남이 없음을 요달하고부터는 모든 영욕에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심명·증도가 강설』, 성철스님법어집 1집 5권, p170)
어찌 근심하고 기뻐하랴” (自從頓悟了無生, 於諸榮辱何憂喜)는 『증도가』를 강설 스님의 이 같은 해석은 비록 스님이 산승으로 불렸다고 하나 속세의 일
하면서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자유자재한 열반에서 에도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던 경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노니는 즐거움을 대중들에게 설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스님의 깊은 내공과 통찰이 스님을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로
선사로서, 산승으로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인내와 정진 만든 배경이자 원인이라고 단언한다.
이 필요한 것인지를 세속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지 못한다. 만일 성철 스 우리 사회에 성철 스님 같은 큰 스승이 없을 때 『벽암록』 제11칙에서 황
님이 단 한 순간, 단 한마디라도 세속 일에 대해 언질하였다면 산승의 지 벽희운 화상이 말하는 ‘지게미에 취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위는 물론 선사로서의 수행이력이 단박에 어긋나는 사태가 벌어졌을지 모 것이다. 지게미를 먹는 사람을 당주조한(噇酒糟漢)이라고 하는데, 당(唐)·
른다. 혹자들은 성철 스님의 침묵이 민중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송(宋) 시대의 속어(俗語)로 ‘순수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욕
비난하기도 했으나 한마디 말로 중생의 구제가 완성되거나 실현되는 것 하는 말이다.
이 아니라는 것을 스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으로 세속사회에서는 정신적으로 의지할 스승이 없는 경우 땜질
이유로 스님은 더 큰 울림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침묵으로 일관했 처방식의 단기처방에 유혹되거나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사술(邪術)
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스님은 『증도가』 46번째 문장 속의 「야승가(野僧 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이와는 반대로 자격도 되지 않는
家) 」를 이렇게 해석했다. 이들이 스스로 스승을 자칭하여 온갖 허세를 부리거나 방정을 떨다 망신
86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