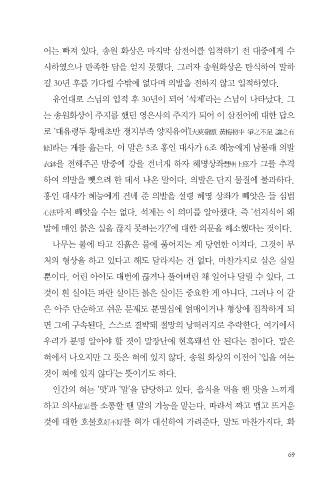Page 71 - 고경 - 2019년 3월호 Vol. 71
P. 71
어는 빠져 있다. 송원 화상은 마지막 삼전어를 입적하기 전 대중에게 수
시하였으나 만족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자 송원화상은 탄식하여 말하
길 30년 후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의발을 전하지 않고 입적하였다.
유언대로 스님의 입적 후 30년이 되어 ‘석계’라는 스님이 나타났다. 그
는 송원화상이 주지를 했던 영은사의 주지가 되어 이 삼전어에 대한 답으
로 ‘대유령두 황매초반 쟁지부족 양지유여’[大庾嶺頭 黃梅初半 爭之不足 讓之有
餘]라는 게를 읊는다. 이 말은 5조 홍인 대사가 6조 혜능에게 남몰래 의발
衣鉢을 전해주곤 밤중에 강을 건너게 하자 혜명상좌慧明上座가 그를 추격
하여 의발을 뺏으려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의발은 단지 물질에 불과하다.
홍인 대사가 혜능에게 건네 준 의발을 설령 혜명 상좌가 빼앗은 들 심법
心法마저 빼앗을 수는 없다. 석계는 이 의미를 알아챘다. 즉 ‘선지식이 왜
발에 매인 붉은 실을 끊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했다는 것이다.
나무는 불에 타고 진흙은 물에 풀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다. 그것이 부
처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마찬가지로 실은 실일
뿐이다. 어린 아이도 대번에 끊거나 풀어버린 채 일어나 달릴 수 있다. 그
것이 흰 실이든 파란 실이든 붉은 실이든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이 같
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문제도 분별심에 얽매이거나 형상에 집착하게 되
면 그에 구속된다. 스스로 결박돼 절망의 낭떠러지로 추락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할 것이 말장난에 현혹돼선 안 된다는 점이다. 말은
혀에서 나오지만 그 뜻은 혀에 있지 않다. 송원 화상의 이전어 ‘입을 여는
것이 혀에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간의 혀는 ‘맛’과 ‘말’을 담당하고 있다. 음식을 먹을 땐 맛을 느끼게
하고 의사意思를 소통할 땐 말의 기능을 맡는다. 따라서 짜고 맵고 뜨거운
것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를 혀가 대신하여 가려준다. 말도 마찬가지다. 화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