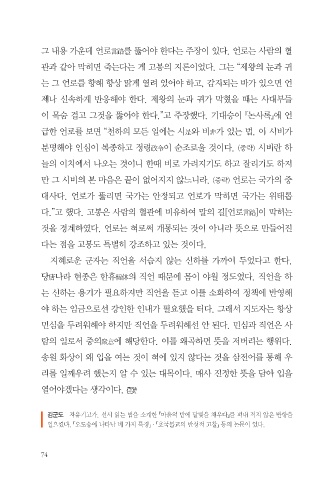Page 76 - 고경 - 2019년 3월호 Vol. 71
P. 76
그 내용 가운데 언로言路를 뚫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언로는 사람의 혈
관과 같아 막히면 죽는다는 게 고봉의 지론이었다. 그는 “제왕의 눈과 귀
는 그 언로를 향해 항상 맑게 열려 있어야 하고, 감지되는 바가 있으면 언
제나 신속하게 반응해야 한다. 제왕의 눈과 귀가 막혔을 때는 사대부들
이 목숨 걸고 그것을 뚫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대승이 『논사록』에 언
급한 언로를 보면 “천하의 모든 일에는 시是와 비非가 있는 법. 이 시비가
분명해야 인심이 복종하고 정령政令이 순조로울 것이다. (중략) 시비란 하
늘의 이치에서 나오는 것이니 한때 비로 가려지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지
만 그 시비의 본 마음은 끝이 없어지지 않느니라. (중략) 언로는 국가의 중
대사다. 언로가 뚫리면 국가는 안정되고 언로가 막히면 국가는 위태롭
다.”고 했다. 고봉은 사람의 혈관에 비유하여 말의 길[언로言路]이 막히는
것을 경계하였다. 언로는 혀로써 개통되는 것이 아니라 뜻으로 만들어진
다는 점을 고봉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혜로운 군자는 직언을 서슴지 않는 신하를 가까이 두었다고 한다.
당唐나라 현종은 한휴韓休의 직언 때문에 몸이 야윌 정도였다. 직언을 하
는 신하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직언을 듣고 이를 소화하여 정책에 반영해
야 하는 임금으로선 강인한 인내가 필요했을 터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민심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직언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민심과 직언은 사
람의 일로서 중의衆意에 해당한다. 이를 왜곡하면 뜻을 저버리는 행위다.
송원 화상이 왜 입을 여는 것이 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삼전어를 통해 우
리를 일깨우려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매사 진정한 뜻을 담아 입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다.
김군도 자유기고가. 선시 읽는 법을 소개한 『마음의 밭에 달빛을 채우다』를 펴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오도송에 나타난 네 가지 특징」·「호국불교의 반성적 고찰」 등의 논문이 있다.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