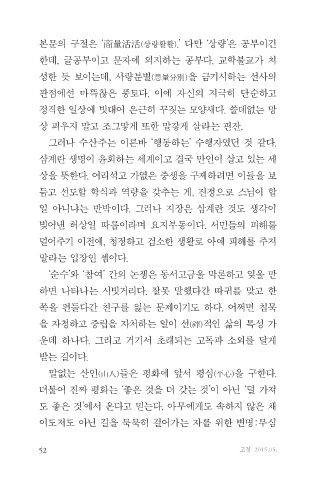Page 54 - 고경 - 2015년 5월호 Vol. 25
P. 54
본문의 구절은 ‘商量活活(상량활활).’ 다만 ‘상량’은 공부이긴 (無心)은 무능하므로 무애(無碍)하다. 끝내 이용당하고 말 수
한데, 글공부이고 문자에 의지하는 공부다. 교학불교가 치 완도, 제 꾀에 넘어가고 말 욕심도 없으므로.
성한 듯 보이는데, 사량분별 (思量分別)을 금기시하는 선사의
관점에선 마뜩찮은 풍토다. 이에 자신의 지극히 단순하고 【제13칙】
정직한 일상에 빗대어 은근히 꾸짖는 모양새다. 쓸데없는 망 임제의 눈먼 나귀(臨濟瞎驢, 임제할려)
상 피우지 말고 조그맣게 또한 말갛게 살라는 핀잔.
그러나 수산주는 이른바 ‘행동하는’ 수행자였던 것 같다. 열반을 앞둔 임제(臨濟)가 원주(院主)였던 삼성(三聖)에게
삼계란 생명이 윤회하는 세계이고 결국 만인이 살고 있는 세 당부했다. “내가 죽은 뒤에도 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
상을 뜻한다. 어리석고 가엾은 중생을 구제하려면 이들을 보 계속 이어지도록 하라.” 이에 삼성은 “어찌 감히 화상의
듬고 선도할 학식과 역량을 갖추는 게, 진정으로 스님이 할 정법안장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라며 안심시켰다. 임
일 아니냐는 반박이다. 그러나 지장은 삼계란 것도 생각이 제는 “혹여 어떤 이가 그대에게 정법안장에 대해 묻는다
빚어낸 허상일 따름이라며 요지부동이다. 서민들의 피해를 면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고 물었다. 삼성은 곧장 “할(喝)!”
덜어주기 이전에, 청정하고 검소한 생활로 아예 피해를 주지 이라며 고함을 내질렀다. 그러자 임제는 “나의 정법안장
말라는 입장인 셈이다. 이 이놈의 눈먼 나귀 따위에 의해 멸할 줄이야 누가 알았
‘순수’와 ‘참여’ 간의 논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잊을 만 겠느냐”며 탄식했다.
하면 나타나는 시빗거리다. 잘못 말했다간 따귀를 맞고 한
쪽을 편들다간 친구를 잃는 문제이기도 하다. 어쩌면 침묵 원주(院主)는 세간의 총무와 비슷하다. 사찰의 살림 전반
을 자청하고 중립을 자처하는 일이 선 (禪)적인 삶의 특성 가 을 맡아보는 소임이다. 일은 많은데 빛은 안 나는 자리다. 주
운데 하나다. 그리고 거기서 초래되는 고독과 소외를 달게 지를 보좌해 상하를 화목케 하고 동료들을 편안케 해야 한
받는 길이다. 다. 주지 스님이 생색을 내고 싶을 때, 원주스님은 고생을 해
말없는 산인 (山人)들은 평화에 앞서 평심(平心)을 구한다. 야 할 팔자다. 더구나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법. 절에 먹을거
더불어 진짜 평화는 ‘좋은 것을 더 갖는 것’이 아닌 ‘덜 가져 리가 떨어지면, 품팔이를 해서라도 창고를 채워야 하는 게
도 좋은 것’에서 온다고 믿는다.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채 원주의 몫이다. 결국 남들의 수행을 돕느라 자기 수행은 뒷
이도저도 아닌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를 위한 변명:무심 전이 되기 십상이다. 선어록에 등장하는 원주 스님들은 대
52 고경 2015.05.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