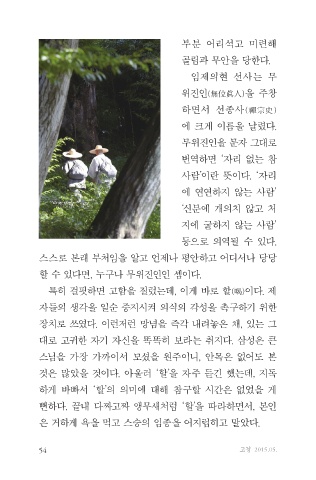Page 56 - 고경 - 2015년 5월호 Vol. 25
P. 56
부분 어리석고 미련해 반면 정사(正史)에 나타나는 삼성은 뛰어난 선승이었다.
골림과 무안을 당한다. 삼성혜연 (三聖慧然). 임제의 법을 이은 것도, 임제의 행장과
임제의현 선사는 무 법문을 모아 『임제록』을 편찬한 것도 그였다. 『벽암록』의 저
위진인 (無位眞人)을 주창 자인 원오극근(圓悟克勤) 선사는 “어려서 많은 사람 가운데
하면서 선종사(禪宗史) 뛰어난 지략이 있었고, 지혜가 우뚝 솟아 사방에 명성이 자
에 크게 이름을 날렸다. 자하였다”고 격찬했다. 어쩌면 임제와 삼성의 대화는 농담과
무위진인을 문자 그대로 반어법을 판돈으로 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을 가능성이
번역하면 ‘자리 없는 참 높다. 하기야 일체의 차별을 걷어내고 문득 대하면, 눈먼 나
사람’이란 뜻이다. ‘자리 귀도 부처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걸을 수는 있다. 심지어 숨
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쉴 줄도 안다.
‘신분에 개의치 않고 처
지에 굴하지 않는 사람’ 【제14칙】
등으로 의역될 수 있다. 곽시자가 찻잔을 건네주다(廓侍過茶, 곽시과다)
스스로 본래 부처임을 알고 언제나 평안하고 어디서나 당당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무위진인인 셈이다. 곽시자(廓侍者)가 덕산(德山)에게 물었다. “그 옛날의 성현
특히 걸핏하면 고함을 질렀는데, 이게 바로 할(喝)이다. 제 들은 다들 어디로 가셨습니까?” 덕산은 제대로 알아듣
자들의 생각을 일순 중지시켜 의식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지 못한 듯 “무엇? 무엇?”이라고 반문했다. 이에 곽시자는
장치로 쓰였다. 이런저런 망념을 즉각 내려놓은 채, 있는 그 “비룡마(飛龍馬)를 대령하라 했더니 절름발이 비루먹은 말
대로 고귀한 자기 자신을 똑똑히 보라는 취지다. 삼성은 큰 을 끌고 온 격이로군요”라며 짐짓 조롱했다. 덕산은 대꾸
스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을 원주이니, 안목은 없어도 본 하지 않았다. 다음날 욕실에서 나온 덕산에게 곽시자가
것은 많았을 것이다. 아울러 ‘할’을 자주 듣긴 했는데, 지독 차를 달여 건네주었다. 그러자 덕산은 곽시자의 등을 토
하게 바빠서 ‘할’의 의미에 대해 참구할 시간은 없었을 게 닥여주었다. 곽시자가 이르되 “저 노인네가 이제야 비로
뻔하다. 끝내 다짜고짜 앵무새처럼 ‘할’을 따라하면서, 본인 소 말길을 알아듣는군!” 덕산은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
은 거하게 욕을 먹고 스승의 임종을 어지럽히고 말았다. 았다.
54 고경 2015.05.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