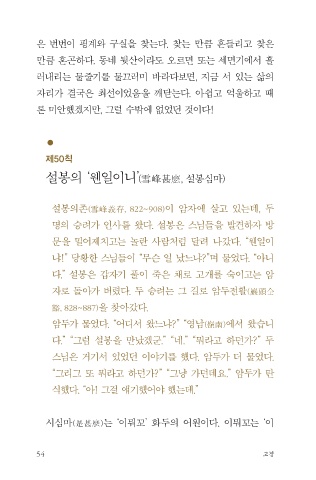Page 56 - 고경 - 2016년 5월호 Vol. 37
P. 56
은 번번이 핑계와 구실을 찾는다. 찾는 만큼 흔들리고 찾은 것은 무엇인가’의 경상도 사투리. 무언가를 보고 있는 이놈은
만큼 혼곤하다. 동네 뒷산이라도 오르면 또는 세면기에서 흘 무엇인가, 자꾸만 밥을 먹게 하는 이놈은 무엇인가, 앉기보다
러내리는 물줄기를 물끄러미 바라다보면, 지금 서 있는 삶의 눕는 걸 좋아하는 이놈은 무엇인가 등등. 시심마는 흔히 탐
자리가 결국은 최선이었음을 깨닫는다. 아쉽고 억울하고 때 하고 노하는 자아에 억눌린 불성을 파악하기 위한 열쇠로 활
론 미안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용된다.
스스로 시작하는 인생은 없다. 누구나 어느 날 갑자기 세
● 상에 내던져질 뿐이다. 태어남이 사고였듯, 돌아감도 어이가
제50칙 없다. 순서도 없고 에누리도 없다. 이름과 신분이 무엇이었든,
설봉의 ‘웬일이니’(雪峰甚麽, 설봉심마) 다들 그저 그렇게 살다가는 것이다. 죽음 앞에서는 다들 별
볼 일 없는 군상이다.
설봉의존(雪峰義存, 822~908)이 암자에 살고 있는데, 두 그러나 죽음은 멀다. 살아 있다면 살아 있음에 최선을 다
명의 승려가 인사를 왔다. 설봉은 스님들을 발견하자 방 하는 것이, 가냘프지만 소중한 권리일 것이다. 설봉의 호들갑
문을 밀어제치고는 놀란 사람처럼 달려 나갔다. “웬일이 은 누가 알아주든 말든, 삶을 무언가 놀라운 것으로 만들어
냐!” 당황한 스님들이 “무슨 일 났느냐?”며 물었다. “아니 가라는 당부가 아닐는지. ‘나’를 힘껏 발산하고 소진하는 과
다.” 설봉은 갑자기 풀이 죽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는 암 정에서, ‘나’는 구태여 찾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 법이다.
자로 돌아가 버렸다. 두 승려는 그 길로 암두전활(巖頭全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어서는 곤란하다. 개돼지들도 행복을
豁, 828~887)을 찾아갔다. 꿈꾸며 산다.
암두가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영남(嶺南)에서 왔습니
다.” “그럼 설봉을 만났겠군.” “네.” “뭐라고 하던가?” 두
스님은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암두가 더 물었다.
“그리그 또 뭐라고 하던가?” “그냥 가던데요.” 암두가 탄
식했다. “아! 그걸 얘기했어야 했는데.”
장웅연 ● 집필노동자.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부터 불교계에서
일하고 있다. ‘장영섭’이란 본명으로 『길 위의 절』, 『눈부시지만, 가짜』, 『공부하지 마라』, 『떠
시심마(是甚麽)는 ‘이뭐꼬’ 화두의 어원이다. 이뭐꼬는 ‘이 나면 그만인데』, 『그냥, 살라』 등의 책을 냈다. 최근작은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54 고경 2016. 05.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