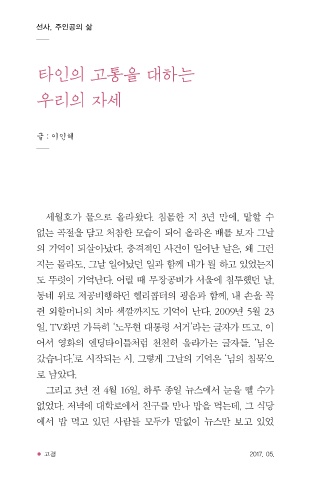Page 56 - 고경 - 2017년 5월호 Vol. 49
P. 56
선사, 주인공의 삶
다. 가라앉는 배를 보면서 내 마음은 “아, 저 아이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랬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며 통곡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하는 부모들을 보면서도 “아,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의 자세 그랬다.
구조를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한동안
은 숨은 뉴스들을 찾아보았다. 유투브나 팟케스트를 통해 유
글 : 이인혜 가족, 생존자, 잠수부 등 관련자들의 증언을 보고 들으면서
화가 치밀었다. 가만있을 수 없어서, 뭐라도 해야겠기에 서명
을 하고 시위에도 나갔다. 그러나 진상규명은커녕, 오히려 유
가족들이 모욕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자, 한편으로는 분노가
심해지고 한편으로는 무력감 때문에 점점 지쳐갔다. 마음이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왔다. 침몰한 지 3년 만에, 말할 수 불편해서 한동안 뉴스조차 보지 않고 외면하다가 바쁜 일상
없는 곡절을 담고 처참한 모습이 되어 올라온 배를 보자 그날 에 묻혀 점점 무관심해져 갔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음에도
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은, 왜 그런 불구하고,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지는 몰라도, 그날 일어났던 일과 함께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일이 없다. 연민으로 시작해서 무관심으로 끝남. 이것이 남에
도 뚜렷이 기억난다. 어릴 때 무장공비가 서울에 침투했던 날, 게 닥친 고통을 대하는 나의 태도이다.
동네 위로 저공비행하던 헬리콥터의 굉음과 함께, 내 손을 꼭 수잔 손택은 『타인의 고통』(이후, 2004)에서 우리에게 연민
쥔 외할머니의 치마 색깔까지도 기억이 난다. 2009년 5월 23 을 넘어선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그녀는 1990년대 보스니아
일, TV화면 가득히 ‘노무현 대통령 서거’라는 글자가 뜨고, 이 전쟁이 한창일 때 그 속에 살았다. 보스니아에 가해진 세르비
어서 영화의 엔딩타이틀처럼 천천히 올라가는 글자들. ‘님은 아인들의 무자비한 만행이 국제뉴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생
갔습니다.’로 시작되는 시. 그렇게 그날의 기억은 ‘님의 침묵’으 히 전해졌고, 저자의 표현대로 ‘스펙터클’한 그 장면들은 사람
로 남았다. 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TV를 통해 중계방송을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3년 전 4월 16일, 하루 종일 뉴스에서 눈을 뗄 수가 은 저런 끔찍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
없었다. 저녁에 대학로에서 친구를 만나 밥을 먹는데, 그 식당 께, 내게 일어난다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와 저 사람들 어떡해
에서 밥 먹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말없이 뉴스만 보고 있었 라는 연민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 고경 2017. 05. 54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