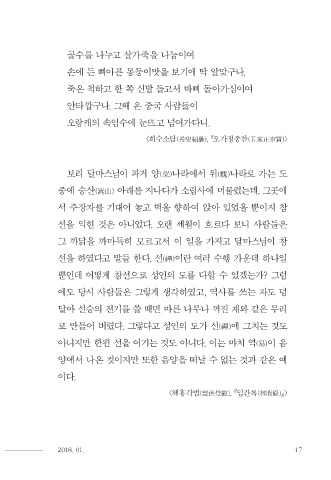Page 19 - 고경 - 2018년 1월호 Vol. 57
P. 19
찬하노라. 골수를 나누고 살가죽을 나눔이여
손에 든 뼈아픈 몽둥이맛을 보기에 딱 알맞구나.
우뚝한 콧날은 임금의 얼굴이요 죽은 척하고 한 쪽 신발 들고서 바삐 돌아가심이여
푸른 눈동자는 천자의 모습이로다. 안타깝구나. 그때 온 중국 사람들이
금수레를 버리고 불도 위해 출가하셨고 오랑캐의 속임수에 눈뜨고 넘어가다니.
보배구슬 논변으로 스승과 맞섰도다. <희수소담(希叟紹曇), 『오가정종찬(五家正宗贊)>
발아래 구름을 일으켜
제자를 보내 이견왕의 사견을 없애고 보리 달마스님이 과거 양(梁)나라에서 위(魏)나라로 가는 도
혓바닥이 파도를 뒤집으니 중에 숭산(嵩山) 아래를 지나다가 소림사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온 나라에 일어난 육종(六宗)의 비방소리 들었도다. 서 주장자를 기대어 놓고 벽을 향하여 앉아 있었을 뿐이지 참
신주적현에서 대승 인물 맞이하니 선을 익힌 것은 아니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 사람들은
동토 서천에서 납승의 본모습을 보여주셨네. 그 까닭을 까마득히 모르고서 이 일을 가지고 달마스님이 참
텅 비어 부처랄 것도 없다 하여 선을 하였다고 말들 한다. 선 (禪)이란 여러 수행 가운데 하나일
왕의 마음을 거슬려 한 줄기 갈대 타고 큰 강을 건너시고 뿐인데 어떻게 참선으로 성인의 도를 다할 수 있겠는가? 그럼
고요히 마음을 관하며 에도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였고, 역사를 쓰는 자도 덩
귀신 끓는 굴속에 앉아 9년 동안 코끼리를 더듬었네. 달아 선승의 전기를 쓸 때면 마른 나무나 꺼진 재와 같은 무리
꽃송이 하나에 다섯 꽃잎 피어남이여 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다고 성인의 도가 선 (禪)에 그치는 것도
마당에 쌓인 눈 허리까지 묻히도록 내버려두고 아니지만 한편 선을 어기는 것도 아니다. 이는 마치 역 (易)이 음
독약을 제호로 만듦이여 양에서 나온 것이지만 또한 음양을 떠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예
웃으며 떠나는 강나루 배에 옥빛 물결 부서지도다. 이다.
담장 같은 마음이여 <혜홍각범(慧洪覺範), 『임간록(林間錄)』>
언제 교외별전 만난 적이 있던가
16 2018.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