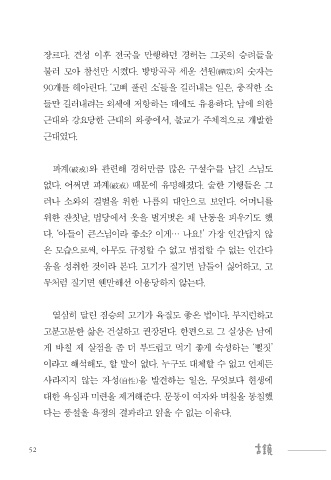Page 54 - 고경 - 2018년 1월호 Vol. 57
P. 54
장르다. 견성 이후 전국을 만행하던 경허는 그곳의 승려들을 태생적으로 코뼈를 갖고 태어나는 포유류들이 돌파구를 찾
불러 모아 참선만 시켰다. 방방곡곡 세운 선원 (禪院)의 숫자는 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고삐 뚫을 구멍이 없는 비강이라면, 기
90개를 헤아린다. ‘고삐 풀린 소’들을 길러내는 일은, 충직한 소 본적으로 호흡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진흙소가 물 위를 걸
들만 길러내려는 외세에 저항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남에 의한 어갈 수 있다면?’ 순종 이외에, 소의 또 다른 속성은 정진이다.
근대와 강요당한 근대의 와중에서, 불교가 주체적으로 개발한 하루 종일 밭을 갈아도 여물 따위만 먹여주면 이튿날 또 간다.
근대였다. 남들보다 뒤처져도 그냥 가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가고 또
간다. 질기지만 순한 힘은 정답고 눈물겨워서 미덥다.
파계 (破戒)와 관련해 경허만큼 많은 구설수를 남긴 스님도
없다. 어쩌면 파계 (破戒) 때문에 유명해졌다. 숱한 기행들은 그 윗물이 맑기가 어려운 까닭은, 너무 많은 자들이 윗물에서
러나 소와의 결별을 위한 나름의 대안으로 보인다. 어머니를 목욕을 하거나 목욕을 하려고 줄을 서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위한 잔칫날, 법당에서 옷을 벌거벗은 채 난동을 피우기도 했 서 제일 어려운 도전은, 몰락이다. 고개를 숙이는 날들이 많아
다. ‘아들이 큰스님이라 좋소? 이게… 나요!’ 가장 인간답지 않 상심이 크다면, 고개를 더 숙여야 한다. 못 생기고 상처받은 발
은 모습으로써, 아무도 규정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인간다 이 그대를 어디로든 옮겨주고 올려다주고 있다. 우무비공처 (牛
움을 성취한 것이라 본다. 고기가 질기면 남들이 싫어하고, 고 無鼻孔處)에는 입 없이 땀 흘리는 것들만 산다.
무처럼 질기면 웬만해선 이용당하지 않는다.
●
열심히 달린 짐승의 고기가 육질도 좋은 법이다. 부지런하고 낙엽은 나무의 뿌리로 돌아간다.
고분고분한 삶은 건실하고 권장된다. 한편으로 그 실상은 남에 낙엽도 꽃이다.
게 바칠 제 살점을 좀 더 부드럽고 먹기 좋게 숙성하는 ‘뻘짓’
이라고 해석해도, 할 말이 없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 언제든 장웅연
사라지지 않는 자성 (自性)을 발견하는 일은, 무엇보다 현생에 — 집필노동자. 1975년생.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부터 <불교신문>에
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본명은 ‘장영섭’. 글 써서 먹고 산다. 포교도 한다. 그간 『불교에 관한 사
대한 욕심과 미련을 제거해준다. 문둥이 여자와 며칠을 동침했 소하지만 결정적인 물음49(2017년 상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길 위의 절(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 등 9권의 책을
다는 풍설을 욕정의 결과라고 읽을 수 없는 이유다. 냈다. 최근작으로 『불교는 왜 그래?』가 있다.
52 2018. 01.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