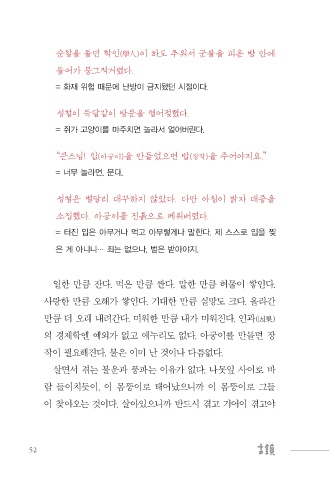Page 54 - 고경 - 2018년 2월호 Vol. 58
P. 54
순찰을 돌던 학인(學人)이 하도 추워서 군불을 피운 방 안에 마는 것이다. 살아있음에서 오는 고통은 따로 주인이 없어서
들어가 뭉그적거렸다.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실직이든 실연이든 실기 (失機)이든 조실
= 화재 위험 때문에 난방이 금지됐던 시절이다. 부모든 나이 어린 직장상사든 홀연히 찾아온 말기 암이든, 여
관방에 손님 들 듯이 들어와 술 먹고 토하고 고스톱 치고 별걸
성철이 득달같이 방문을 열어젖혔다.
다 한다.
= 쥐가 고양이를 마주치면 놀라서 얼어버린다.
불청객들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스스로 인생을 여관
“큰스님! 입(아궁이)을 만들었으면 밥(장작)을 주어야지요.” 방쯤으로 여기는 것이다. 실제로도 여관방이다. ‘이게 바로 나’
= 너무 놀라면, 문다. 라고 떠벌여 봐야, 이번 생에 한정된 한 조각 넝마이고 낭하일
뿐이다. 남녀가 급히 사랑을 나누고 떠나간 공간 한쪽에, 내 이
성철은 별달리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아침이 밝자 대중을
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수건이 걸려 있다. ‘경축(慶祝)’이라고 쓰
소집했다. 아궁이를 진흙으로 메워버렸다.
이긴 했는데, 누가 거기다 코를 풀었다.
= 터진 입은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말한다. 제 스스로 입을 찢
은 게 아니니… 죄는 없으나, 벌은 받아야지. ●
모기를 손으로 쳐 죽이던 순간,
일한 만큼 잔다. 먹은 만큼 싼다. 말한 만큼 허물이 쌓인다. 노숙자가 나타나 담배 한 개비를 얻어갔다.
사랑한 만큼 오해가 쌓인다.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다. 올라간
선방했다.
만큼 더 오래 내려간다. 미워한 만큼 내가 미워진다. 인과(因果)
의 경제학엔 예외가 없고 에누리도 없다. 아궁이를 만들면 장 당장은.
작이 필요해진다. 불은 이미 난 것이나 다름없다.
살면서 겪는 불운과 풍파는 이유가 없다. 나뭇잎 사이로 바 장웅연
— 집필노동자. 1975년생.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부터 <불교신문>에
람 들이치듯이, 이 몸뚱이로 태어났으니까 이 몸뚱이로 그들 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본명은 ‘장영섭’. 글 써서 먹고 산다. 포교도 한다. 그간 『불교에 관한 사
소하지만 결정적인 물음49(2017년 상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길 위의 절(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이 찾아오는 것이다. 살아있으니까 반드시 겪고 기어이 겪고야 우수교양도서)』,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 등 9권의 책을
냈다. 최근작으로 『불교는 왜 그래?』가 있다.
52 2018. 02.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