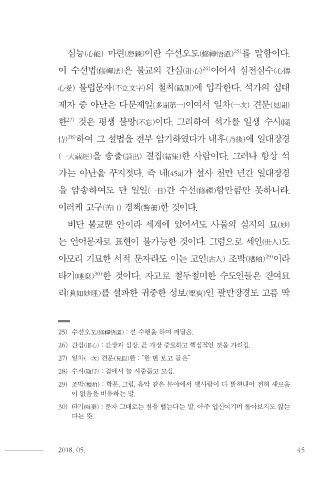Page 47 - 고경 - 2018년 5월호 Vol. 61
P. 47
19)
18)
25)
(黑暗深夜) 에 백천일월(百千日月) 일시병출(一時並出) 하는 대 심능(心能) 마련(磨鍊)이란 수선오도(修禪悟道) 를 말함이다.
20)
26)
전환이 있어야만 각기 본구(本具) 한 현지신행(玄知神行)의 위 이 수선법 (修禪法)은 불교의 간심(肝心) 이어서 심전심수(心傳
력이 발현되기 따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문자인 장경 心受)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철칙(鐵則)에 입각한다. 석가의 십대
(藏經)에만 주력(注力)하면은 이는 핵변환의 설계서(設計書)만 독 제자 중 아난은 다문제일 (多聞第一)이여서 일차(一次) 견문(見聞)
[44b]송(讀誦)하여 원자력을 획득하려 함과 일반(一般)이다. 한 것은 평생 불망(不忘)이다. 그리하여 석가를 일생 수시(隨
21)
27)
실지의 시행이 없이 설계만으로는 천만 년 가도 막대한 원자력 侍) 하여 그 설법을 전부 암기하였다가 내후(乃後)에 일대장경
28)
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팔만 장경을 전부 암기하여도 실지로 (一大藏經)을 송출(誦出) 결집(結集)한 사람이다. 그러나 항상 석
심능(心能) 수련을 안흐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화병(畵餠) 22) 가는 아난을 꾸지젓다. 즉 네 [45a]가 설사 천만 년간 일대장경
23)
만 드러다보고 있다가는 결국은 아사(餓死) 케 되는 것임으로 을 암송하여도 단 일일 (一日)간 수선(修禪)함만큼만 못하니라.
24)
설식종불포(說食終不飽) 라 함은 차(此)를 두고 일음이다. 이러케 고구(苦口) 경책(警策)한 것이다.
비단 불교뿐 안이라 세계에 있어서도 사물의 실지의 묘(妙)
는 언어문자로 표현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으로 세인(世人)도
아모리 기묘한 서적 문자라도 이는 고인 (古人) 조박(糟粕) 이라
29)
18) 흑암심야(黑暗深夜) : 완전히 캄캄한 한밤중.
30)
19) 백천일월 (百千日月) 일시병출(一時並出) : 수많은 해와 달이 동시에 나타남. 타기 (唾棄) 한 것이다. 자고로 철두철미한 수도인들은 진여묘
20) 본구(本具) : 본래부터 갖추고 있음.
리 (眞如妙理)를 설파한 귀중한 성보(聖寶)인 팔만장경도 고름 딱
21) 일반(一般)이다 : “마찬가지이다”
22) 화병 (畵餠) : 그림 속의 떡.
23) 아사(餓死) : 굶어죽음.
25) 수선오도(修禪悟道) : 선 수행을 하여 깨달음.
24) 설식종불포(說食終不飽) : 한산시(寒山詩)의 한 구절. 26) 간심 (肝心) : 간장과 심장. 곧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가리킴.
說食終不飽(설식종불포) 밥을 말해도 끝내 배부르지 않고
說衣不免寒(설의불면한) 옷을 말해도 추위를 못 면하네 27) 일차(一次) 견문(見聞)한 : “한 번 보고 들은”
飽喫須是飯(포끽수시반) 배 부르려면 밥을 먹어야 하고 28) 수시 (隨侍) : 곁에서 늘 시중들고 모심.
著衣方免寒(착의방면한) 추의를 면하려면 옷을 입어야 하네
不解審思量(불해심사량) 깊이 생각해 헤아릴 줄 모르고 29) 조박(糟粕) : 학문, 그림, 음악 같은 분야에서 옛사람이 다 밝혀내어 전혀 새로움
祗道求佛難(지도구불난) 다만 부처 구히기 어렵다 말할 뿐 이 없음을 비유하는 말.
廻心卽是佛(회심즉시불) 마음 한 번 돌리면 곧 부처이니 30) 타기 (唾棄) : 문자 그대로는 침을 뱉는다는 말. 아주 업신여기며 돌아보지도 않는
莫向外頭看(막향외두간) 멀리 밖에서 구하지 말라. 다는 뜻.
44 2018. 05.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