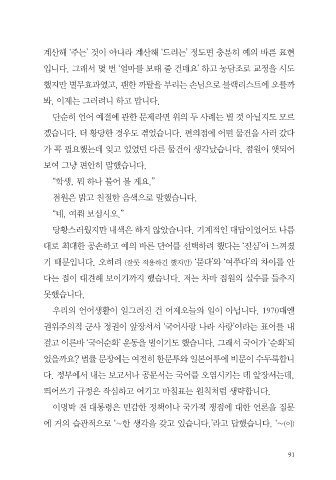Page 93 - 고경 - 2018년 8월호 Vol. 64
P. 93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 ‘드리는’ 정도면 충분히 예의 바른 표현
입니다. 그래서 몇 번 ‘얼마를 보태 줄 건데요’ 하고 농담조로 교정을 시도
했지만 별무효과였고, 괜한 까탈을 부리는 손님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를까
봐,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맙니다.
단순히 언어 예절에 관한 문제라면 위의 두 사례는 별 것 아닐지도 모르
겠습니다. 더 황당한 경우도 겪었습니다. 편의점에 어떤 물건을 사러 갔다
가 꼭 필요했는데 잊고 있었던 다른 물건이 생각났습니다. 점원이 앳되어
보여 그냥 편안히 말했습니다.
“학생, 뭐 하나 물어 볼 게요.”
점원은 밝고 친절한 음색으로 말했습니다.
“네, 여쭤 보십시오.”
당황스러웠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인 대답이었어도 나름
대로 최대한 공손하고 예의 바른 단어를 선택하려 했다는 ‘진심’이 느껴졌
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잘못 적용하긴 했지만) ‘묻다’와 ‘여쭈다’의 차이를 안
다는 점이 대견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차마 점원의 실수를 들추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언어생활이 일그러진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70대엔
권위주의적 군사 정권이 앞장서서 ‘국어사랑 나라 사랑’이라는 표어를 내
걸고 이른바 ‘국어순화’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순화’되
었을까요? 법률 문장에는 여전히 한문투와 일본어투에 비문이 수두룩합니
다. 정부에서 내는 보고서나 공문서는 국어를 오염시키는 데 앞장서는데,
띄어쓰기 규정은 작심하고 어기고 마침표는 원칙처럼 생략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민감한 정책이나 국가적 쟁점에 대한 언론을 질문
에 거의 습관적으로 ‘~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