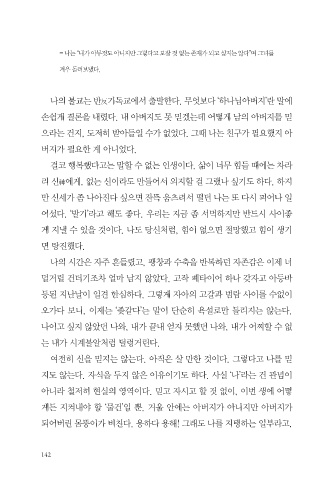Page 144 - 고경 - 2018년 9월호 Vol. 65
P. 144
=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잘 것 없는 존재가 되고 싶지는 않다”며 그녀를
겨우 돌려보냈다.
나의 불교는 반反기독교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아버지’란 말에
손쉽게 결론을 내렸다. 내 아버지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남의 아버지를 믿
으라는 건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친구가 필요했지 아
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었다.
결코 행복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이다. 삶이 너무 힘들 때에는 차라
리 신神에게, 없는 신이라도 만들어서 의지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다. 하지
만 신세가 좀 나아진다 싶으면 잔뜩 움츠려서 떨던 나는 또 다시 피어나 일
어섰다. ‘발기’라고 해도 좋다. 우리는 지금 좀 서먹하지만 반드시 사이좋
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당신처럼, 힘이 없으면 절망했고 힘이 생기
면 탕진했다.
나의 시간은 자주 흔들렸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던 자존감은 이제 너
덜거릴 건더기조차 얼마 남지 않았다. 고작 폐타이어 하나 갖자고 아등바
등된 지난날이 일견 한심하다. 그렇게 자아의 고갈과 범람 사이를 수없이
오가다 보니, 이제는 ‘좆같다’는 말이 단순히 욕설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나이고 싶지 않았던 나와, 내가 끝내 얻지 못했던 나와, 내가 어찌할 수 없
는 내가 시계불알처럼 덜렁거린다.
여전히 신을 믿지는 않는다. 아직은 살 만한 것이다. 그렇다고 나를 믿
지도 않는다. 자식을 두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나’라는 건 관념이
아니라 철저히 현실의 영역이다. 믿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이번 생에 어떻
게든 지켜내야 할 ‘물건’일 뿐. 거울 안에는 아버지가 아니지만 아버지가
되어버린 몸뚱이가 비친다. 용하다 용해! 그래도 나를 지탱하는 일부라고,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