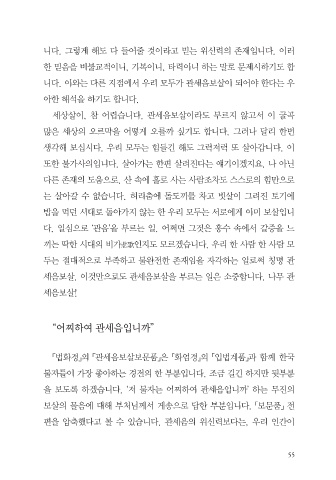Page 57 - 고경 - 2019년 3월호 Vol. 71
P. 57
니다. 그렇게 해도 다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위신력의 존재입니다. 이러
한 믿음을 비불교적이니, 기복이니, 타력이니 하는 말로 문제시하기도 합
니다. 이와는 다른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한다는 우
아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살이, 참 어렵습니다. 관세음보살이라도 부르지 않고서 이 굴곡
많은 세상의 오르막을 어떻게 오를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힘들긴 해도 그럭저럭 또 살아갑니다. 이
또한 불가사의입니다. 살아가는 한편 살려진다는 얘기이겠지요. 나 아닌
다른 존재의 도움으로. 산 속에 홀로 사는 사람조차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허리춤에 돌도끼를 차고 빗살이 그려진 토기에
밥을 먹던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이미 보살입니
다. 일심으로 ‘관음ʼ을 부르는 일. 어쩌면 그것은 홍수 속에서 갈증을 느
끼는 딱한 시대의 비가悲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
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일로써 칭명 관
세음보살. 이것만으로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일은 소중합니다. 나무 관
세음보살!
“어찌하여 관세음입니까”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은 『화엄경』의 「입법계품」과 함께 한국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의 한 부분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뒷부분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불자는 어찌하여 관세음입니까ʼ 하는 무진의
보살의 물음에 대해 부처님께서 게송으로 답한 부분입니다. 「보문품」 전
편을 압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음의 위신력보다는, 우리 인간이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