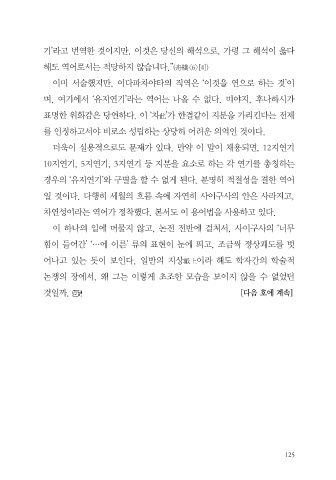Page 127 - 고경 - 2019년 9월호 Vol. 77
P. 127
기’라고 번역한 것이지만, 이것은 당신의 해석으로, 가령 그 해석이 옳다
해도 역어로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舟橋<6>[4])
이미 서술했지만, 이다파차야타의 직역은 ‘이것을 연으로 하는 것’이
며, 여기에서 ‘유지연기’라는 역어는 나올 수 없다. 미야지, 후나하시가
표명한 위화감은 당연하다. 이 ‘차此’가 한결같이 지분을 가리킨다는 전제
를 인정하고서야 비로소 성립하는 상당히 어려운 의역인 것이다.
더욱이 실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만약 이 말이 채용되면, 12지연기
10지연기, 5지연기, 3지연기 등 지분을 요소로 하는 각 연기를 총칭하는
경우의 ‘유지연기’와 구별을 할 수 없게 된다. 분명히 적절성을 결한 역어
일 것이다. 다행히 세월의 흐름 속에 자연히 사이구사의 안은 사라지고,
차연성이라는 역어가 정착했다. 본서도 이 용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하나의 일에 머물지 않고, 논전 전반에 걸쳐서, 사이구사의 ‘너무
힘이 들어간’ ‘…에 이른’ 류의 표현이 눈에 띄고, 조금씩 정상괘도를 벗
어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일반의 지상紙上이라 해도 학자간의 학술적
논쟁의 장에서, 왜 그는 이렇게 초조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일까. [다음 호에 계속]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