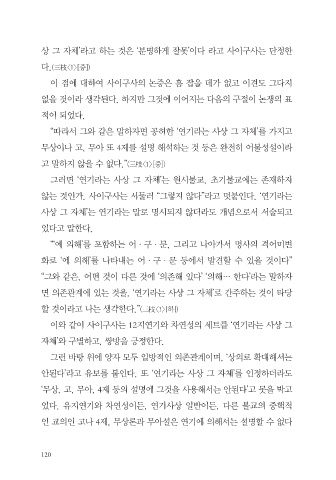Page 122 - 고경 - 2019년 9월호 Vol. 77
P. 122
상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이다 라고 사이구사는 단정한
다.(三枝<1>[중])
이 점에 대하여 사이구사의 논증은 흠 잡을 데가 없고 이견도 그다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그것에 이어지는 다음의 구절이 논쟁의 표
적이 되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말하자면 공허한 ‘연기라는 사상 그 자체’를 가지고
무상이나 고, 무아 또 4제를 설명 해석하는 것 등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라
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三枝<1>[중])
그러면 ‘연기라는 사상 그 자체’는 원시불교, 초기불교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사이구사는 서둘러 “그렇지 않다”라고 덧붙인다. ‘연기라는
사상 그 자체’는 연기라는 말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개념으로서 서술되고
있다고 말한다.
“‘에 의해’를 포함하는 어·구·문, 그리고 나아가서 명사의 격어미변
화로 ‘에 의해’를 나타내는 어·구·문 등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어떤 것이 다른 것에 ‘의존해 있다’ ‘의해… 한다’라는 말하자
면 의존관계에 있는 것을, ‘연기라는 사상 그 자체’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三枝<1>[하])
이와 같이 사이구사는 12지연기와 차연성의 세트를 ‘연기라는 사상 그
자체’와 구별하고, 쌍방을 긍정한다.
그런 바탕 위에 양자 모두 일방적인 의존관계이며, ‘상의로 확대해서는
안된다’라고 유보를 붙인다. 또 ‘연기라는 사상 그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무상, 고, 무아, 4제 등의 설명에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고
있다. 유지연기와 차연성이든, 연기사상 일반이든, 다른 불교의 중핵적
인 교의인 고나 4제, 무상론과 무아설은 연기에 의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