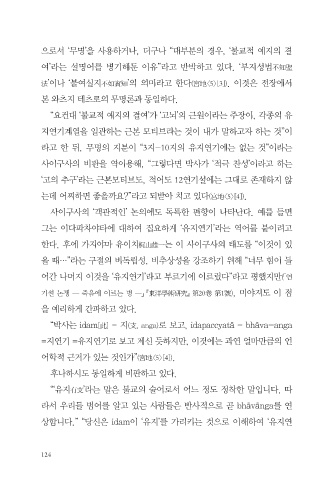Page 126 - 고경 - 2019년 9월호 Vol. 77
P. 126
으로서 ‘무명’을 사용하거나, 더구나 “대부분의 경우, ‘불교적 예지의 결
여’라는 설명어를 병기해둔 이유”라고 반박하고 있다. ‘부지성법不知聖
法’이나 ‘불여실지不如實知’의 의미라고 한다(宮地<5>[3]). 이것은 전장에서
본 와츠지 테츠로의 무명론과 동일하다.
“요컨대 ‘불교적 예지의 결여’가 ‘고뇌’의 근원이라는 주장이, 각종의 유
지연기계열을 일관하는 근본 모티브라는 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라고 한 뒤, 무명의 지분이 “3지-10지의 유지연기에는 없는 것”이라는
사이구사의 비판을 역이용해, “그렇다면 박사가 ‘적극 찬성’이라고 하는
‘고의 추구’라는 근본모티브도, 적어도 12연기설에는 그대로 존재하지 않
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라고 되받아 치고 있다(宮地<5>[4]).
사이구사의 ‘객관적인’ 논의에도 독특한 편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그는 이다파차야타에 대하여 집요하게 ‘유지연기’라는 역어를 붙이려고
한다. 후에 가지야마 유이치梶山雄一는 이 사이구사의 태도를 “이것이 있
을 때…”라는 구절의 비독립성, 비추상성을 강조하기 위해 “너무 힘이 들
어간 나머지 이것을 ‘유지연기’라고 부르기에 이르렀다”라고 평했지만(「연
기설 논쟁 ― 죽음에 이르는 병 ―」 『東洋學術硏究』 第20卷 第1號), 미야지도 이 점
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다.
“박사는 idam[此] = 지(支, anga)로 보고, idapaccyatā = bhāva-anga
=지연기 =유지연기로 보고 계신 듯하지만, 이것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언
어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宮地<5>[4]).
후나하시도 동일하게 비판하고 있다.
“‘유지有支’라는 말은 불교의 술어로서 어느 정도 정착한 말입니다. 따
라서 우리들 범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곧 bhāvānga를 연
상합니다.” “당신은 idam이 ‘유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여 ‘유지연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