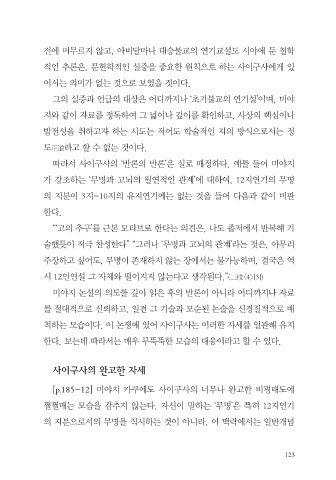Page 125 - 고경 - 2019년 9월호 Vol. 77
P. 125
전에 머무르지 않고, 아비달마나 대승불교의 연기교설도 시야에 둔 철학
적인 추론은, 문헌학적인 실증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사이구사에게 있
어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의 실증과 언급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초기불교의 연기설’이며, 미야
지와 같이 자료를 정독하여 그 넓이나 깊이를 확인하고, 사상의 핵심이나
발전성을 취하고자 하는 시도는 적어도 학술적인 지의 방식으로서는 정
도正道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구사의 ‘반론의 반론’은 실로 매정하다. 예를 들어 미야지
가 강조하는 ‘무명과 고뇌의 필연적인 관계’에 대하여, 12지연기의 무명
의 지분이 3지-10지의 유지연기에는 없는 것을 들어 다음과 같이 비판
한다.
“‘고의 추구’를 근본 모티브로 한다는 의견은, 나도 졸저에서 반복해 기
술했듯이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무명과 고뇌의 관계’라는 것은, 아무리
주장하고 싶어도, 무명이 존재하지 않는 장에서는 불가능하며, 결국은 역
시 12인연설 그 자체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三枝<4>[3])
미야지 논설의 의도를 깊이 읽은 후의 반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료
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일견 그 기술과 모순된 논술을 신경질적으로 배
척하는 모습이다. 이 논쟁에 있어 사이구사는 이러한 자세를 일관해 유지
한다. 보는데 따라서는 매우 무뚝뚝한 모습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구사의 완고한 자세
[p.185-12] 미야지 카쿠에도 사이구사의 너무나 완고한 비평태도에
쩔쩔매는 모습을 감추지 않는다. 자신이 말하는 ‘무명’은 특히 12지연기
의 지분으로서의 무명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맥락에서는 일반개념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