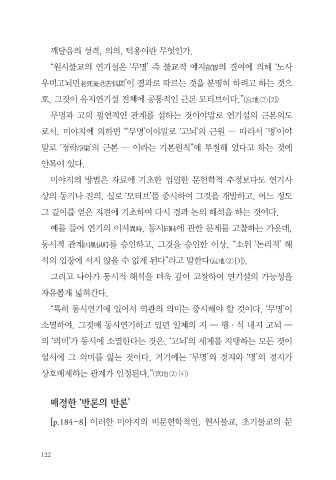Page 124 - 고경 - 2019년 9월호 Vol. 77
P. 124
깨달음의 성격, 의의, 덕용이란 무엇인가.
“원시불교의 연기설은 ‘무명’ 즉 불교적 예지叡智의 결여에 의해 ‘노사
우비고뇌민老死憂悲苦惱悶’이 결과로 따르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으
로, 그것이 유지연기설 전체에 공통적인 근본 모티브이다.”(宮地<2>[2])
무명과 고의 필연적인 관계를 설하는 것이야말로 연기설의 근본의도
로서, 미야지에 의하면 “‘무명’이야말로 ‘고뇌’의 근원 ― 따라서 ‘명’이야
말로 ‘정락淨樂’의 근본 ― 이라는 기본원칙”에 투철해 있다고 하는 것에
안목이 있다.
미야지의 방법은 자료에 기초한 엄밀한 문헌학적 추정보다도 연기사
상의 동기나 진의, 실로 ‘모티브’를 중시하여 그것을 개발하고, 어느 정도
그 깊이를 얻은 지견에 기초하여 다시 경과 논의 해석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기의 이시異時, 동시同時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는 가운데,
동시적 관계因果俱時를 승인하고, 그것을 승인한 이상, “소위 ‘논리적’ 해
석의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한다(宮地<2>[3]).
그리고 나아가 동시적 해석을 더욱 깊이 고찰하여 연기설의 가능성을
자유롭게 넓혀간다.
“특히 동시연기에 있어서 역관의 의미는 중시해야 할 것이다. ‘무명’이
소멸하여, 그것에 동시연기하고 있던 일체의 지 ― 행·식 내지 고뇌 ―
의 ‘의미’가 동시에 소멸한다는 것은, ‘고뇌’의 세계를 지탱하는 모든 것이
일시에 그 의미를 잃는 것이다. 거기에는 ‘무명’의 경지와 ‘명’의 경지가
상호배제하는 관계가 인정된다.”(宮地<2>[4])
매정한 ‘반론의 반론’
[p.184-8] 이러한 미야지의 비문헌학적인, 원시불교, 초기불교의 문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