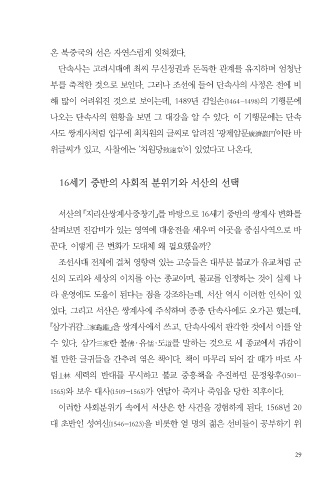Page 31 - 고경 - 2021년 9월호 Vol. 101
P. 31
온 북중국의 선은 자연스럽게 잊혀졌다.
단속사는 고려시대에 최씨 무신정권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에 들어 단속사의 사정은 전에 비
해 많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1489년 김일손(1464-1498)의 기행문에
나오는 단속사의 현황을 보면 그 대강을 알 수 있다. 이 기행문에는 단속
사도 쌍계사처럼 입구에 최치원의 글씨로 알려진 ‘광제암문廣濟巖門’이란 바
위글씨가 있고, 사찰에는 ‘치원당致遠堂’이 있었다고 나온다.
16세기 중반의 사회적 분위기와 서산의 선택
서산의 「지리산쌍계사중창기」를 바탕으로 16세기 중반의 쌍계사 변화를
살펴보면 진감비가 있는 영역에 대웅전을 세우며 이곳을 중심사역으로 바
꾼다. 이렇게 큰 변화가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 영향력 있는 고승들은 대부분 불교가 유교처럼 군
신의 도리와 세상의 이치를 아는 종교이며, 불교를 인정하는 것이 실제 나
라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서산 역시 이러한 인식이 있
었다. 그리고 서산은 쌍계사에 주석하며 종종 단속사에도 오가곤 했는데,
『삼가귀감三家龜鑑』을 쌍계사에서 쓰고, 단속사에서 판각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삼가三家란 불佛·유儒·도道를 말하는 것으로 세 종교에서 귀감이
될 만한 글귀들을 간추려 엮은 책이다. 책이 마무리 되어 갈 때가 바로 사
림士林 세력의 반대를 무시하고 불교 중흥책을 추진하던 문정왕후(1501-
1565)와 보우 대사(1509-1565)가 연달아 죽거나 죽임을 당한 직후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서산은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1568년 20
대 초반인 성여신(1546-1623)을 비롯한 열 명의 젊은 선비들이 공부하기 위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