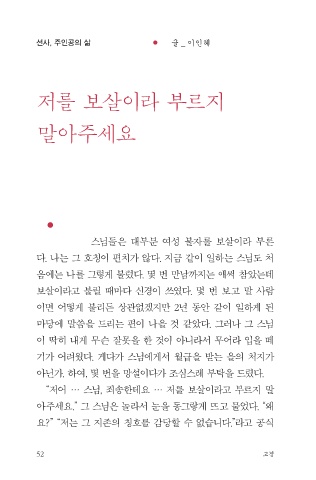Page 54 - 고경 - 2016년 10월호 Vol. 42
P. 54
선사, 주인공의 삶 ● 글 _ 이인혜 적인 이유를 댔다. “허어~” 하는 탄식과 함께, “대체 왜 그러
냐?”고 다시 물어왔다.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더듬더듬 말을 이었다. “저어 … 진짜
저를 보살이라 부르지 죄송한데요 … 비구스님들이 … 저를 보살이라고 부르면요 …
하대 받는 느낌이 들어서요 … 부탁드려요 ….” 동그랗게 뜬
말아주세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하는 표정으
로, 스님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그 몇 초가 상당히 길었다.
침묵을 깨고 스님이 말을 이었다. “사부대중이 평등한데 어
쩌다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어이없다는, 황
당하다는, 딱하다는,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어보이면서. “네
에? 사부대중이 평등하다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 번에는 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긴 한숨을 얹어서 반
스님들은 대부분 여성 불자를 보살이라 부른 사해드렸다. 내 딴에는 눈에 힘주고 레이저를 쏘면서 말씀드
다. 나는 그 호칭이 편치가 않다. 지금 같이 일하는 스님도 처 렸으나 안광이 빛을 발하지 못했는지 눈이 단추 구멍이라 그
음에는 나를 그렇게 불렀다. 몇 번 만남까지는 애써 참았는데 런지 전달이 안 된 듯했다. 조심스레 안색을 살피니, 그 스님
보살이라고 불릴 때마다 신경이 쓰였다. 몇 번 보고 말 사람 은 이미 나를, 말도 안 되는 걸로 ‘딴지’를 거는 이상한 사람
이면 어떻게 불리든 상관없겠지만 2년 동안 같이 일하게 된 으로 보는 듯했다. 보살, 이 아름답고 심오한 호칭에 거부감
마당에 말씀을 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스님 을 느끼는 속내를 어떻게 이해시켜드려야 할지 막막했다. 그
이 딱히 내게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서 무어라 입을 떼 것도 대한민국, 남자, 오십대, 조계종 비구, 수좌에게 말이다.
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스님에게서 월급을 받는 을의 처지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투지를 잃었다.
아닌가. 하여, 몇 번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부탁을 드렸다. 서로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아까보다 좀 더 긴 침묵이 이
“저어 … 스님, 죄송한데요 … 저를 보살이라고 부르지 말 어진 후 스님이 어렵사리 입을 떼었다. “그러면 무어라고 불
아주세요.” 그 스님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왜 러 드릴까요?” “이름 불러주세요.” 1초도 안 되어 튀어나온
요?” “저는 그 지존의 칭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공식 답이다. 그러나 이름 부르는 게 어려웠던 스님은 그 후로 한
52 고경 2016. 10.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