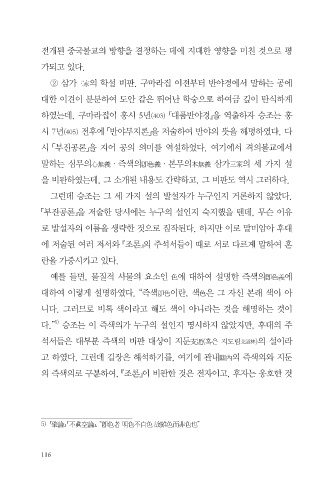Page 118 - 고경 - 2019년 3월호 Vol. 71
P. 118
전개된 중국불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② 삼가三家의 학설 비판. 구마라집 이전부터 반야경에서 말하는 공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여 도안 같은 뛰어난 학숭으로 하여금 깊이 탄식하게
하였는데, 구마라집이 홍시 5년(403) 『대품반야경』을 역출하자 승조는 홍
시 7년(405) 전후에 「반야무지론」을 저술하여 반야의 뜻을 해명하였다. 다
시 「부진공론」을 지어 공의 의미를 역설하였다. 여기에서 격의불교에서
말하는 심무의心無義·즉색의卽色義·본무의本無義 삼가三家의 세 가지 설
을 비판하였는데, 그 소개된 내용도 간략하고, 그 비판도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승조는 그 세 가지 설의 발설자가 누구인지 거론하지 않았다.
「부진공론」을 저술한 당시에는 누구의 설인지 숙지했을 텐데, 무슨 이유
로 발설자의 이름을 생략한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후대
에 저술된 여러 저서와 『조론』의 주석서들이 때로 서로 다르게 말하여 혼
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물질적 사물의 요소인 色에 대하여 설명한 즉색의卽色義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다. “즉색卽色이란, 색色은 그 자신 본래 색이 아
니다. 그러므로 비록 색이라고 해도 색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는 것이
5)
다.” 승조는 이 즉색의가 누구의 설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후대의 주
석서들은 대부분 즉색의 비판 대상이 지둔支遁(혹은 지도림支道林)의 설이라
고 하였다. 그런데 길장은 해석하기를, 여기에 관내關內의 즉색의와 지둔
의 즉색의로 구분하여, 『조론』이 비판한 것은 전자이고, 후자는 옹호한 것
5) 『肇論』 「不眞空論」, “卽色者 明色不自色 故雖色而非色也”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