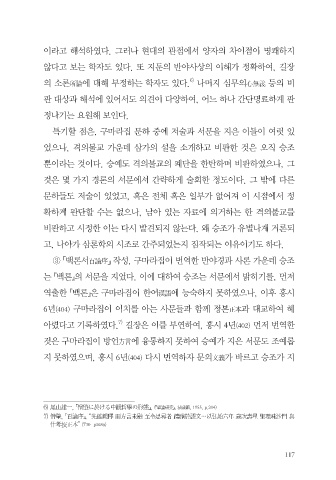Page 119 - 고경 - 2019년 3월호 Vol. 71
P. 119
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관점에서 양자의 차이점이 명쾌하지
않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또 지둔의 반야사상의 이해가 정확하여, 길장
6)
의 소론所論에 대해 부정하는 학자도 있다. 나머지 심무의心無義 등의 비
판 대상과 해석에 있어서도 의견이 다양하여, 어느 하나 간단명료하게 판
정나기는 요원해 보인다.
특기할 점은, 구마라집 문하 중에 저술과 서문을 지은 이들이 여럿 있
었으나, 격의불교 가운데 삼가의 설을 소개하고 비판한 것은 오직 승조
뿐이라는 것이다. 승예도 격의불교의 폐단을 한탄하며 비판하였으나, 그
것은 몇 가지 경론의 서문에서 간략하게 술회한 정도이다. 그 밖에 다른
문하들도 저술이 있었고, 혹은 전체 혹은 일부가 없어져 이 시점에서 정
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남아 있는 자료에 의거하는 한 격의불교를
비판하고 시정한 이는 다시 발견되지 않는다. 왜 승조가 유별나게 거론되
고, 나아가 삼론학의 시조로 간주되었는지 짐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③ 「백론서百論序」 작성. 구마라집이 번역한 반야경과 사론 가운데 승조
는 『백론』의 서문을 지었다. 이에 대하여 승조는 서문에서 밝히기를, 먼저
역출한 『백론』은 구마라집이 한어漢語에 능숙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홍시
6년(404) 구마라집이 이치를 아는 사문들과 함께 정본正本과 대교하여 헤
7)
아렸다고 기록하였다. 길장은 이를 부연하여, 홍시 4년(402) 먼저 번역한
것은 구마라집이 방언方言에 융통하지 못하여 승예가 지은 서문도 조예롭
지 못하였으며, 홍시 6년(404) 다시 번역하자 문의文義가 바르고 승조가 지
6) 尾山雄一, 「僧肇に於ける中觀哲學の形態」, (『肇論硏究』, 法藏館, 1955, p.204)
7) 僧肇, 「百論序」, “先雖親釋 而方言未融 至令思尋者 躊躇於謬文…以弘始六年 歲次壽星 集理味沙門 與
什考挍正本” (T30-p168a)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