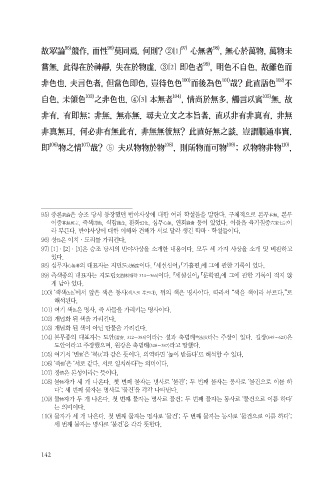Page 144 - 고경 - 2019년 3월호 Vol. 71
P. 144
97)
98)
95)
96)
故眾論 競作, 而性 莫同焉. 何則? ②[1] 心無者 , 無心於萬物, 萬物未
99)
嘗無. 此得在於神靜, 失在於物虛. ③[2] 即色者 , 明色不自色, 故雖色而
102)
101)
100)
非色也. 夫言色者, 但當色即色, 豈待色色 而後為色 哉? 此直語色 不
103)
104)
105)
自色, 未領色 之非色也. ④[3] 本無者 , 情尚於無多, 觸言以賓 無. 故
非有, 有即無; 非無, 無亦無. 尋夫立文之本旨者, 直以非有非真有, 非無
非真無耳. 何必非有無此有, 非無無彼無? 此直好無之談, 豈謂順通事實,
107)
106)
108)
110)
109)
即 物之情 哉? ⑤ 夫以物物於物 , 則所物而可物 ; 以物物非物 ,
95) 중론衆論은 승조 당시 등장했던 반야사상에 대한 여러 학설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본무本無, 본무
이종本無異宗, 즉색即色, 식함識含, 환화幻化, 심무心無, 연회緣會 등이 있었다. 이들을 육가칠종六家七宗이
라 부른다. 반야사상에 대한 이해와 견해가 서로 달라 생긴 학파·학설들이다.
96) 성性은 이치·도리를 가리킨다.
97) [1]·[2]·[3]은 승조 당시의 반야사상을 소개한 내용이다. 모두 세 가지 사상을 소개 및 비판하고
있다.
98) 심무자心無者의 대표자는 지민도支敏度이다. 『세설신어』 「가휼편」에 그에 관한 기록이 있다.
99) 즉색종의 대표자는 지도림支道林(대략 314∼366)이다. 『세설신어』 「문학편」에 그에 관한 기록이 적지 않
게 남아 있다.
100) ‘색색色色’에서 앞은 색은 동사(색으로 부르다), 뒤의 색은 명사이다. 따라서 “색을 색이라 부르다.”로
해석된다.
101) 여기 색色은 명사, 즉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102) 개념화 된 색을 가리킨다.
103) 개념화 된 색이 아닌 만물을 가리킨다.
104) 본무종의 대표자는 도안(道安. 312∼385)이라는 설과 축법태竺法汰라는 주장이 있다. 길장(549∼623)은
도안이라고 주장했으며, 원강은 축법태(320∼387)라고 말했다.
105) 여기서 ‘빈賓’은 ‘복伏’과 같은 뜻이다. 의역하면 ‘높이 받들다’로 해석할 수 있다.
106) ‘즉即’은 ‘서로 같다, 서로 일치하다’는 의미이다.
107) 정情은 본성이라는 뜻이다.
108) 물物자가 세 개 나온다. 첫 번째 물자는 명사로 ‘물건’; 두 번째 물자는 동사로 ‘물건으로 이름 하
다’; 세 번째 물자는 명사로 ‘물건’을 각각 나타낸다.
109) 물物자가 두 개 나온다. 첫 번째 물자는 명사로 물건; 두 번째 물자는 동사로 ‘물건으로 이름 하다’
는 의미이다.
110) 물자가 세 개 나온다. 첫 번째 물자는 명사로 ‘물건’; 두 번째 물자는 동사로 ‘물건으로 이름 하다’;
세 번째 물자는 명사로 ‘물건’을 각각 뜻한다.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