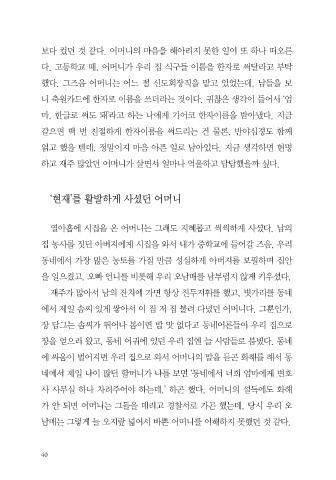Page 42 - 고경 - 2019년 6월호 Vol. 74
P. 42
보다 컸던 것 같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일이 또 하나 떠오른
다.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우리 집 식구들 이름을 한자로 써달라고 부탁
했다. 그즈음 어머니는 어느 절 신도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남들을 보
니 축원카드에 한자로 이름을 쓰더라는 것이다. 귀찮은 생각이 들어서 ‘엄
마, 한글로 써도 돼’라고 하는 나에게 기어코 한자이름을 받아냈다. 지금
같으면 백 번 친절하게 한자이름을 써드리는 건 물론, 반야심경도 함께
읽고 했을 텐데, 정말이지 마음 아픈 일로 남아있다. 지금 생각하면 현명
하고 재주 많았던 어머니가 살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 싶다.
‘현재’를 활발하게 사셨던 어머니
열아홉에 시집을 온 어머니는 그래도 지혜롭고 씩씩하게 사셨다. 남의
집 농사를 짓던 아버지에게 시집을 와서 내가 중학교에 들어갈 즈음,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많은 농토를 가질 만큼 성실하게 아버지를 보필하며 집안
을 일으켰고, 오빠 언니를 비롯해 우리 오남매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셨다.
재주가 많아서 남의 잔치에 가면 항상 진두지휘를 했고, 볏가리를 동네
에서 제일 솜씨 있게 쌓아서 이 집 저 집 불려 다녔던 어머니다. 그뿐인가,
장 담그는 솜씨가 뛰어나 봄이면 밥 맛 없다고 동네어른들이 우리 집으로
장을 얻으러 왔고, 동네 어귀에 있던 우리 집엔 늘 사람들로 붐볐다. 동네
에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 집으로 와서 어머니의 말을 듣곤 화해를 해서 동
네에서 제일 나이 많던 할머니가 나를 보면 ‘동네에서 너희 엄마에게 변호
사 사무실 하나 차려주어야 하는데.’ 하곤 했다. 어머니의 설득에도 화해
가 안 되면 어머니는 그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가곤 했는데, 당시 우리 오
남매는 그렇게 늘 오지랖 넓어서 바쁜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