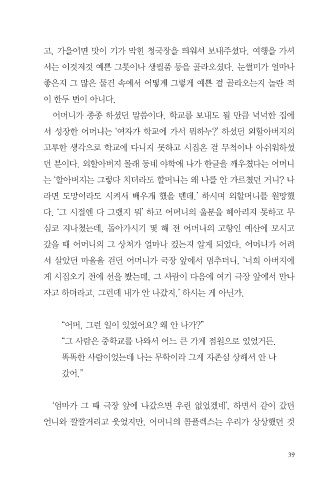Page 41 - 고경 - 2019년 6월호 Vol. 74
P. 41
고, 가을이면 맛이 기가 막힌 청국장을 띄워서 보내주셨다. 여행을 가셔
서는 이것저것 예쁜 그릇이나 생필품 등을 골라오셨다. 눈썰미가 얼마나
좋은지 그 많은 물건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쁜 걸 골라오는지 놀란 적
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머니가 종종 하셨던 말씀이다. 학교를 보내도 될 만큼 넉넉한 집에
서 성장한 어머니는 ‘여자가 학교에 가서 뭐하누?’ 하셨던 외할아버지의
고루한 생각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시집온 걸 무척이나 아쉬워하셨
던 분이다. 외할아버지 몰래 동네 야학에 나가 한글을 깨우쳤다는 어머니
는 ‘할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할머니는 왜 나를 안 가르쳤던 거니? 나
라면 도망이라도 시켜서 배우게 했을 텐데.’ 하시며 외할머니를 원망했
다. ‘그 시절엔 다 그랬지 뭐’ 하고 어머니의 울분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
심코 지나쳤는데, 돌아가시기 몇 해 전 어머니의 고향인 예산에 모시고
갔을 때 어머니의 그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어려
서 살았던 마을을 걷던 어머니가 극장 앞에서 멈추더니, ‘너희 아버지에
게 시집오기 전에 선을 봤는데, 그 사람이 다음에 여기 극장 앞에서 만나
자고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안 나갔지.’ 하시는 게 아닌가.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안 나가?”
“그 사람은 중학교를 나와서 어느 큰 가게 점원으로 있었거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무학이라 그게 자존심 상해서 안 나
갔어.”
‘엄마가 그 때 극장 앞에 나갔으면 우린 없었겠네’, 하면서 같이 갔던
언니와 깔깔거리고 웃었지만, 어머니의 콤플렉스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