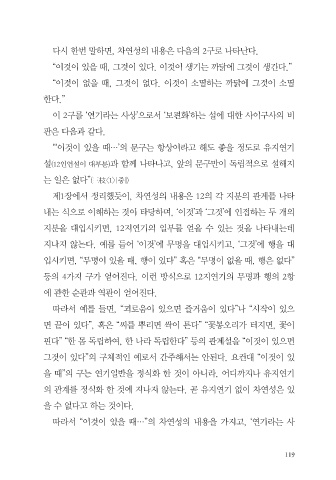Page 121 - 고경 - 2019년 9월호 Vol. 77
P. 121
다시 한번 말하면, 차연성의 내용은 다음의 2구로 나타난다.
“이것이 있을 때, 그것이 있다. 이것이 생기는 까닭에 그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그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하는 까닭에 그것이 소멸
한다.”
이 2구를 ‘연기라는 사상’으로서 ‘보편화’하는 설에 대한 사이구사의 비
판은 다음과 같다.
“‘이것이 있을 때…’의 문구는 항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유지연기
설(12인연설이 대부분)과 함께 나타나고, 앞의 문구만이 독립적으로 설해지
는 일은 없다”(三枝<1>[중])
제1장에서 정리했듯이, 차연성의 내용은 12의 각 지분의 관계를 나타
내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것’과 ‘그것’에 인접하는 두 개의
지분을 대입시키면, 12지연기의 일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것’에 무명을 대입시키고, ‘그것’에 행을 대
입시키면, “무명이 있을 때, 행이 있다” 혹은 “무명이 없을 때, 행은 없다”
등의 4가지 구가 얻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12지연기의 무명과 행의 2항
에 관한 순관과 역관이 얻어진다.
따라서 예를 들면, “괴로움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다”나 “시작이 있으
면 끝이 있다”, 혹은 “씨를 뿌리면 싹이 튼다” “꽃봉오리가 터지면, 꽃이
핀다” “한 몸 독립하여, 한 나라 독립한다” 등의 관계설을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다”의 구체적인 예로서 간주해서는 안된다. 요컨대 “이것이 있
을 때”의 구는 연기일반을 정식화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지연기
의 관계를 정식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곧 유지연기 없이 차연성은 있
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있을 때…”의 차연성의 내용을 가지고, ‘연기라는 사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