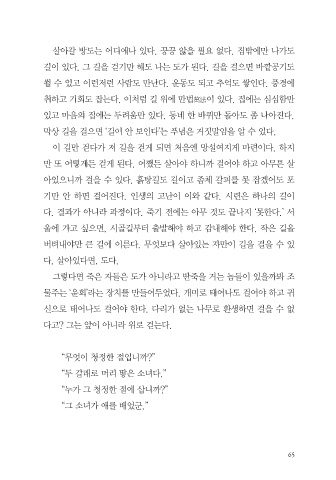Page 67 - 고경 - 2019년 12월호 Vol. 80
P. 67
살아갈 방도는 어디에나 있다. 끙끙 앓을 필요 없다. 집밖에만 나가도
길이 있다. 그 길을 걷기만 해도 나는 도가 된다. 길을 걸으면 바깥공기도
쐴 수 있고 이런저런 사람도 만난다. 운동도 되고 추억도 쌓인다. 풍경에
취하고 기회도 잡는다. 이처럼 길 위에 만법萬法이 있다. 집에는 심심함만
있고 마음의 집에는 두려움만 있다.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좀 나아진다.
막상 길을 걸으면 ‘길이 안 보인다’는 푸념은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이 길만 걷다가 저 길을 걷게 되면 처음엔 망설여지게 마련이다. 하지
만 또 어떻게든 걷게 된다.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 걸어야 하고 아무튼 살
아있으니까 걸을 수 있다. 흙탕길도 길이고 좀체 갈피를 못 잡겠어도 포
기만 안 하면 걸어진다. 인생의 고난이 이와 같다. 시련은 하나의 길이
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죽기 전에는 아무 것도 끝나지 ‘못한다.’ 서
울에 가고 싶으면, 시골길부터 출발해야 하고 감내해야 한다. 작은 길을
버텨내야만 큰 길에 이른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자만이 길을 걸을 수 있
다. 살아있다면, 도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은 도가 아니라고 딴죽을 거는 놈들이 있을까봐 조
물주는 ‘윤회’라는 장치를 만들어두었다. 개미로 태어나도 걸어야 하고 귀
신으로 태어나도 걸어야 한다. 다리가 없는 나무로 환생하면 걸을 수 없
다고? 그는 앞이 아니라 위로 걷는다.
“무엇이 청정한 절입니까?”
“두 갈래로 머리 땋은 소녀다.”
“누가 그 청정한 절에 삽니까?”
“그 소녀가 애를 배었군.”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