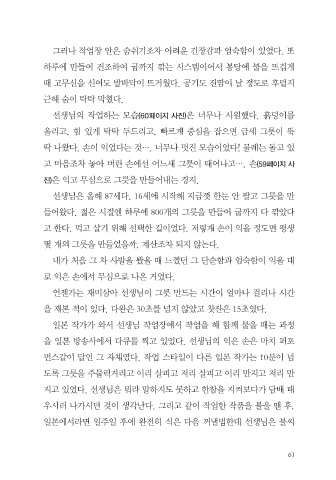Page 63 - 고경 - 2019년 12월호 Vol. 80
P. 63
그러나 작업장 안은 숨쉬기조차 어려운 긴장감과 엄숙함이 있었다. 또
하루에 만들어 건조하여 굽까지 깎는 시스템이어서 봉당에 불을 뜨겁게
때 고무신을 신어도 발바닥이 뜨거웠다. 공기도 진땀이 날 정도로 후덥지
근해 숨이 탁탁 막혔다.
선생님의 작업하는 모습(60페이지 사진)은 너무나 시원했다. 흙덩이를
올리고, 힘 있게 탁탁 두드리고, 빠르게 중심을 잡으면 금세 그릇이 뚝
딱 나왔다. 손이 익었다는 것….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다! 물레는 돌고 있
고 마음조차 놓아 버린 손에선 어느새 그릇이 태어나고…. 손(59페이지 사
진)은 익고 무심으로 그릇을 만들어내는 경지.
선생님은 올해 87세다. 16세에 시작해 지금껏 한눈 안 팔고 그릇을 만
들어왔다. 젊은 시절엔 하루에 800개의 그릇을 만들어 굽까지 다 깎았다
고 한다.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다. 저렇게 손이 익을 정도면 평생
몇 개의 그릇을 만들었을까. 계산조차 되지 않는다.
내가 처음 그 차 사발을 봤을 때 느꼈던 그 단순함과 엄숙함이 익을 대
로 익은 손에서 무심으로 나온 거였다.
언젠가는 재미삼아 선생님이 그릇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시간
을 재본 적이 있다. 다완은 30초를 넘지 않았고 찻잔은 15초였다.
일본 작가가 와서 선생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해 함께 불을 때는 과정
을 일본 방송사에서 다큐를 찍고 있었다. 선생님의 익은 손은 마치 퍼포
먼스같이 달인 그 자체였다. 작업 스타일이 다른 일본 작가는 10분이 넘
도록 그릇을 주물럭거리고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이리 만지고 저리 만
지고 있었다. 선생님은 뭐라 말하지도 못하고 한참을 지켜보다가 담배 태
우시러 나가시던 것이 생각난다. 그리고 같이 작업한 작품을 불을 땐 후,
일본에서라면 일주일 후에 완전히 식은 다음 꺼낼법한데 선생님은 불씨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