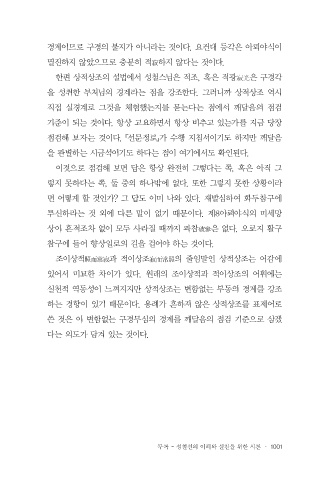Page 1001 - 정독 선문정로
P. 1001
경계이므로 구경의 불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요컨대 등각은 아뢰야식이
멸진하지 않았으므로 충분히 적寂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상적상조의 설법에서 성철스님은 적조, 혹은 적광寂光은 구경각
을 성취한 부처님의 경계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상적상조 역시
직접 실경계로 그것을 체험했는지를 묻는다는 점에서 깨달음의 점검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항상 고요하면서 항상 비추고 있는가를 지금 당장
점검해 보자는 것이다. 『선문정로』가 수행 지침서이기도 하지만 깨달음
을 판별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는 점이 여기에서도 확인된다.
이것으로 점검해 보면 답은 항상 완전히 그렇다는 쪽, 혹은 아직 그
렇지 못하다는 쪽, 둘 중의 하나밖에 없다. 또한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도 이미 나와 있다. 재발심하여 화두참구에
투신하라는 것 외에 다른 말이 없기 때문이다. 제8아뢰야식의 미세망
상이 흔적조차 없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파참破參은 없다. 오로지 활구
참구에 들어 향상일로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조이상적照而常寂과 적이상조寂而常照의 줄임말인 상적상조는 어감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원래의 조이상적과 적이상조의 어휘에는
실천적 역동성이 느껴지지만 상적상조는 변함없는 부동의 경계를 강조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용례가 흔하지 않은 상적상조를 표제어로
쓴 것은 이 변함없는 구경무심의 경계를 깨달음의 점검 기준으로 삼겠
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부록 - 성철선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시론 ·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