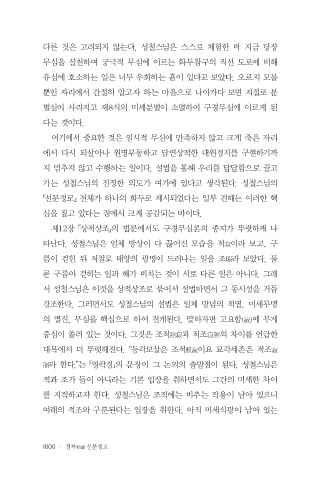Page 1000 - 정독 선문정로
P. 1000
다른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 성철스님은 스스로 체험한 바 지금 당장
무심을 실천하여 궁극적 무심에 이르는 화두참구의 직선 도로에 비해
유심에 호소하는 일은 너무 우회하는 흠이 있다고 보았다. 오로지 모를
뿐인 자리에서 간절히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저절로 분
별심이 사라지고 제8식의 미세분별이 소멸하여 구경무심에 이르게 된
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시적 무심에 만족하지 않고 크게 죽은 자리
에서 다시 되살아나 원명부동하고 담연상적한 대원경지를 구현하기까
지 멈추지 않고 수행하는 일이다. 설법을 통해 우리를 답답함으로 끌고
가는 성철스님의 진정한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성철스님의
『선문정로』 전체가 하나의 화두로 제시되었다는 일부 견해는 이러한 핵
심을 짚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공감되는 바이다.
제12장 「상적상조」의 법문에서도 구경무심론의 종지가 뚜렷하게 나
타난다. 성철스님은 일체 망상이 다 끊어진 모습을 적寂이라 보고, 구
름이 걷힌 뒤 저절로 태양의 광명이 드러나는 일을 조照라 보았다. 물
론 구름이 걷히는 일과 해가 비치는 것이 서로 다른 일은 아니다. 그래
서 성철스님은 이것을 상적상조로 묶어서 설법하면서 그 동시성을 거듭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성철스님의 설법은 일체 망념의 적멸, 미세무명
의 멸진, 무심을 핵심으로 하여 전개된다. 말하자면 고요함(寂)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는 것이다. 그것은 조적照寂과 적조寂照의 차이를 언급한
대목에서 더 뚜렷해진다. “등각보살은 조적照寂이요 묘각세존은 적조寂
照라 한다.”는 『영락경』의 문장이 그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성철스님은
적과 조가 둘이 아니라는 기본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간의 미세한 차이
를 지적하고자 한다. 성철스님은 조적에는 비추는 작용이 남아 있으니
여래의 적조와 구분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아직 미세식광이 남아 있는
1000 · 정독精讀 선문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