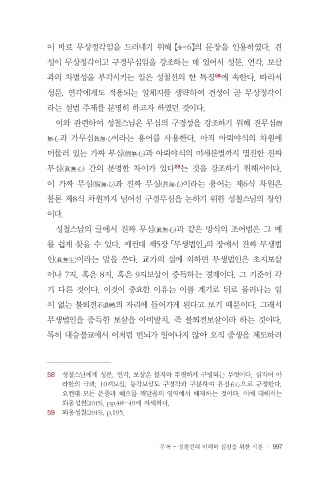Page 997 - 정독 선문정로
P. 997
이 바로 무상정각임을 드러내기 위해 【4-6】의 문장을 인용하였다. 견
성이 무상정각이고 구경무심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성문, 연각, 보살
58
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일은 성철선의 한 특징 에 속한다. 따라서
성문, 연각에게도 적용되는 일체지를 생략하여 견성이 곧 무상정각이
라는 설법 주제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철스님은 무심의 구경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무심假
無心과 가무심眞無心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아직 아뢰야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가짜 무심(假無心)과 아뢰야식의 미세분별까지 멸진한 진짜
무심(眞無心) 간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 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59
이 가짜 무심(假無心)과 진짜 무심(眞無心)이라는 용어는 제6식 차원은
물론 제8식 차원까지 넘어선 구경무심을 논하기 위한 성철스님의 창안
이다.
성철스님의 글에서 진짜 무심(眞無心)과 같은 방식의 조어법은 그 예
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제5장 「무생법인」의 장에서 진짜 무생법
인(眞無生)이라는 말을 쓴다. 교가의 설에 의하면 무생법인은 초지보살
이나 7지, 혹은 8지, 혹은 9지보살이 증득하는 경계이다. 그 기준이 각
기 다른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계기로 뒤로 물러나는 일
이 없는 불퇴전不退轉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생법인을 증득한 보살을 아비발치, 즉 불퇴전보살이라 하는 것이다.
특히 대승불교에서 이처럼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 오직 중생을 제도하리
58 성철스님에게 성문, 연각, 보살은 불지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무엇이다. 심지어 아
라한의 극과, 10지보살, 등각보살도 구경각과 구분하여 유심有心으로 규정한다.
요컨대 모든 분증과 해오를 깨달음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퇴옹성철(2015), pp.48-49에 자세하다.
59 퇴옹성철(2015), p.195.
부록 - 성철선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시론 · 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