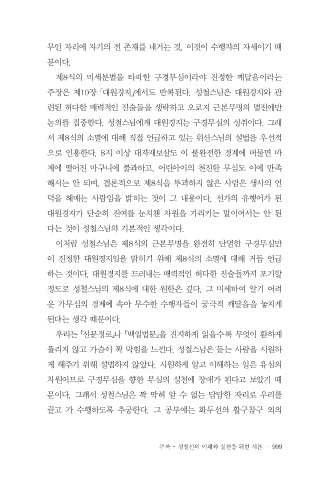Page 999 - 정독 선문정로
P. 999
무인 자리에 자기의 전 존재를 내거는 것, 이것이 수행자의 자세이기 때
문이다.
제8식의 미세분별을 타파한 구경무심이라야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주장은 제10장 「대원경지」에서도 반복된다. 성철스님은 대원경지와 관
련된 허다한 매력적인 진술들을 생략하고 오로지 근본무명의 멸진에만
논의를 집중한다. 성철스님에게 대원경지는 구경무심의 성취이다. 그래
서 제8식의 소멸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는 위산스님의 설법을 우선적
으로 인용한다. 8지 이상 대자재보살도 이 불완전한 경계에 머물면 마
계에 떨어진 마구니에 불과하고, 어린아이의 천진한 무심도 이에 만족
해서는 안 되며, 결론적으로 제8식을 투과하지 않은 사람은 생사의 언
덕을 헤매는 사람임을 밝히는 것이 그 내용이다. 선가의 유행어가 된
대원경지가 단순히 진여를 눈치챈 차원을 가리키는 말이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이 성철스님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처럼 성철스님은 제8식의 근본무명을 완전히 단멸한 구경무심만
이 진정한 대원경지임을 밝히기 위해 제8식의 소멸에 대해 거듭 언급
하는 것이다. 대원경지를 드러내는 매력적인 허다한 진술들까지 포기할
정도로 성철스님의 제8식에 대한 원한은 깊다. 그 미세하여 알기 어려
운 가무심의 경계에 속아 무수한 수행자들이 궁극적 깨달음을 놓치게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는 『선문정로』나 『백일법문』을 진지하게 읽을수록 무엇이 환하게
풀리지 않고 가슴이 꽉 막힘을 느낀다. 성철스님은 듣는 사람을 시원하
게 해주기 위해 설법하지 않았다. 시원하게 알고 이해하는 일은 유심의
차원이므로 구경무심을 향한 무심의 실천에 장애가 된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그래서 성철스님은 꽉 막혀 알 수 없는 답답한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 수행하도록 추궁한다. 그 공부에는 화두선의 활구참구 외의
부록 - 성철선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시론 · 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