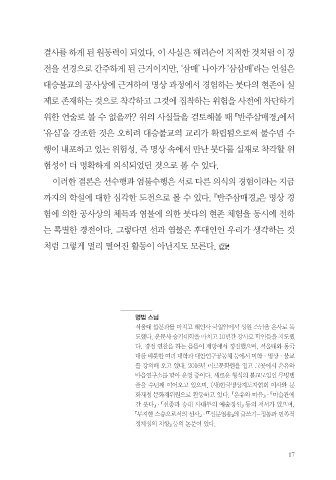Page 17 - 고경 - 2018년 7월호 Vol. 63
P. 17
결사를 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이 사실은 해리슨이 지적한 것처럼 이 경
전을 선경으로 간주하게 된 근거이지만, ‘삼매’ 나아가 ‘삼삼매’라는 언설은
대승불교의 공사상에 근거하여 명상 과정에서 경험하는 붓다의 현존이 실
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언술로 볼 수 없을까? 위의 사실들을 검토해볼 때 『반주삼매경』에서
‘유심’을 강조한 것은 오히려 대승불교의 교리가 확립됨으로써 불수념 수
행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 즉 명상 속에서 만난 붓다를 실재로 착각할 위
험성이 더 명확하게 의식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선수행과 염불수행은 서로 다른 의식의 경험이라는 지금
까지의 학설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반주삼매경』은 명상 경
험에 의한 공사상의 체득과 염불에 의한 붓다의 현존 체험을 동시에 전하
는 특별한 경전이다. 그렇다면 선과 염불은 후대인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진 활동이 아닌지도 모른다.
명법 스님
서울대 불문과를 마치고 해인사 국일암에서 성원 스님을 은사로 득
도했다. 운문사 승가대학을 마치고 10년간 강사로 학인들을 지도했
다. 경전 연찬을 하는 틈틈이 제방에서 정진했으며, 서울대와 동국
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과 대안연구공동체 등에서 미학·명상·불교
를 강의해 오고 있다. 2016년 미르문화원을 열고 그곳에서 은유와
마음연구소를 맡아 운영 중이다. 새로운 형식의 불교모임인 무빙템
플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와 문
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은유와 마음』·『미술관에
간 붓다』·『선종과 송대 사대부의 예술정신』 등의 저서가 있으며,
「무지한 스승으로서의 선사」·「『선문염송』의 글쓰기-정통과 민족적
정체성의 지향」 등의 논문이 있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