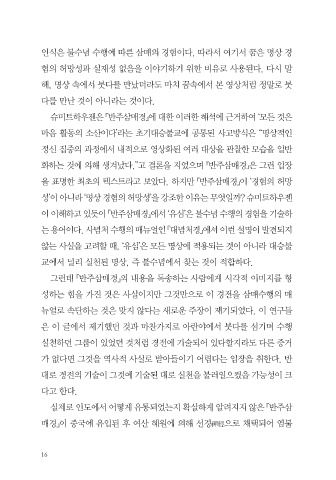Page 16 - 고경 - 2018년 7월호 Vol. 63
P. 16
인식은 불수념 수행에 따른 삼매의 경험이다. 따라서 여기서 꿈은 명상 경
험의 허망성과 실재성 없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비유로 사용된다. 다시 말
해, 명상 속에서 붓다를 만났더라도 마치 꿈속에서 본 영상처럼 정말로 붓
다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슈미트하우젠은 『반주삼매경』에 대한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모든 것은
마음 활동의 소산이다’라는 초기대승불교에 공통된 사고방식은 “명상적인
정신 집중의 과정에서 내적으로 영상화된 여러 대상을 관찰한 모습을 일반
화하는 것에 의해 생겨났다.”고 결론을 지었으며 『반주삼매경』은 그런 입장
을 표명한 최초의 텍스트라고 보았다. 하지만 『반주삼매경』이 ‘경험의 허망
성’이 아니라 ‘명상 경험의 허망성’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슈미트하우젠
이 이해하고 있듯이 『반주삼매경』에서 ‘유심’은 불수념 수행의 경험을 기술하
는 용어이다. 사념처 수행의 매뉴얼인 『대념처경』에서 이런 설명이 발견되지
않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유심’은 모든 명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승불
교에서 널리 실천된 명상, 즉 불수념에서 찾는 것이 적합하다.
그런데 『반주삼매경』의 내용을 독송하는 사람에게 시각적 이미지를 형
성하는 힘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이 경전을 삼매수행의 매
뉴얼로 속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들
은 이 글에서 제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란야에서 붓다를 섬기며 수행
실천하던 그룹이 있었던 것처럼 경전에 기술되어 있다할지라도 다른 증거
가 없다면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다. 반
대로 경전의 기술이 그것에 기술된 대로 실천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크
다고 한다.
실제로 인도에서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은 『반주삼
매경』이 중국에 유입된 후 여산 혜원에 의해 선경禪經으로 채택되어 염불
16